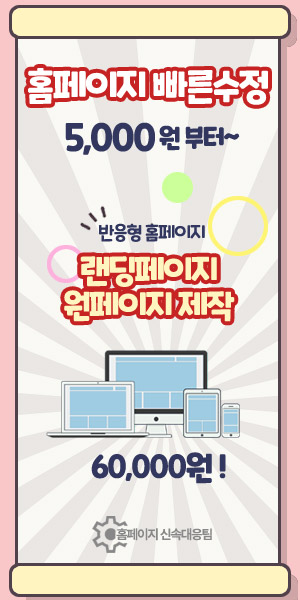(3)śėďžĚė ÍłįŽ≥ł žõźŽ¶¨žĚīžěź žĚīžĻėžĚł žĚĆžĖĎ(ťôįťôĹ) žė§ŪĖČ(šļĒŤ°Ć) Íłįžīą ÍįēžĚė(3)
Page info
Writer Date24-04-18 00:00 Hit58 Comment0Link
-
 https://youtu.be/XbFAAN06TVw
4- Connection
https://youtu.be/XbFAAN06TVw
4- Connection
Body


* ŪėĄžě•ÍįēžĚė ŽįŹ ÍīÄŽ†®ÍĶźžě¨ Ž¨łžĚėŽäĒ daum žĻīŪéė 'ÍįÄžõź žĚīžú§žąô Í≤ĹžóįŪēôŽčĻ‚Äô
https://cafe.daum.net/well48 Í≥ĶžßÄžā¨Ūē≠ žįłž°įŪēėžĄłžöĒ.
žē장úžĚė ÍįēžĚė (1)Í≥ľ (2)žĚė žóįžě•žĄ†žÉĀžóź žěąŽäĒ ŪÜĶŪē© Žāīžö©žĚīŽč§.
--------------------------------------------------------------------------------------------------------------
ŚćóŚźĎ(Žā®ŪĖ•)žĚĄ Íłįž§ÄžúľŽ°ú ŪēėŽäĒ Ś∑¶ťôĹŚŹ≥ťôį(žĘĆžĖĎžöįžĚĆ)Í≥ľ Ś∑¶śĚĪŚŹ≥Ť•Ņ(žĘĆŽŹôžöįžĄú)žĚė śĖáŚĆĖ
žē장ú žĚĆžĖĎžė§ŪĖČŽŹĄžôÄ žĄ†ŪõĄž≤úŪĆĒÍīėŽį©žúĄŽŹĄ ŽďĪžóźžĄú žĚīŽĮł žāīŪéīŽ≥īžēėžßÄŽßĆ ŽÜćÍ≤ĹŽ¨łŪôĒžĚł ŪēúžěźŽ¨łŪôĒÍ∂ƞ󟞥úŽäĒ žĄúÍĶ¨žĚė Žį©ŪĖ•ŪĎúžčúžôÄŽäĒ ž†ēŽįėŽĆÄŽ°ú Žā®ž™ĹžĚĄ žúĄŽ°ú ŪēėÍ≥† ŽŹôžĄúŽ•ľ žĘĆžöįŽ°ú ŪēėŽäĒ Žį©ŪĖ•žĚĄ žć®žôĒÍ≥†, Ž™®Žď† Ž∂ĄžēľÍįÄ žĚīŽ•ľ ŽįĒŪÉēžúľŽ°ú Ť®ėŤŅįŽźėÍ≥† Žįúž†ĄŽźėžĖī žôĒŽč§.
žöįŽ¶¨ŽāėŽĚľžĚė Í≤ĹžöįŽ•ľ Ž≥īŽćĒŽĚľŽŹĄ žßÄÍĶ¨žĚė Ž∂ĀŽįėŽ∂Äžóź žúĄžĻėŪēėŽ©īžĄú Í≤®žöłžóźŽäĒ ŽąąžĚī ŽāīŽ¶¨Ž©į ž∂•Í≥†, žó¨Ž¶ĄžĚÄ ŽĻĄÍįÄ ŽßéžĚÄ ŽŹôžčúžóź Žć•Žč§. ŽėźŪēú Í≤®žöłžóźŽäĒ ŪēīÍįÄ Žä¶Í≤Ć Žú®Í≥† žĚľžįć žßÄŽ©īžĄú Žā®ž§ĎÍ≥†ŽŹĄÍįÄ ŽāģÍ≥†, žó¨Ž¶ĄžóźŽäĒ ŪēīÍįÄ žĚľžįć Žú®Í≥† Žä¶Í≤Ć žßÄŽ©īžĄú Žā®ž§ĎÍ≥†ŽŹĄÍįÄ ŽÜíŽč§. žĚīŽüį ž†źžĚĄ Í≥†Ž†§Ūēėžó¨ Í≤®žöłžóźŽäĒ ŪĖáŽ≥ēžĚĄ ŽßéžĚī ŽįõžēĄŽď§žó¨ ŽĒįŽúĽŪēėÍ≤Ć ŪēėÍ≥†, žó¨Ž¶ĄžóźŽäĒ žßĎžēąžúľŽ°ú Žď§žĖīžė§ŽäĒ ŪĖáŽ≥ēžĚĄ žĶúŽĆÄŪēú ŽßČžēĄ žčúžõźŪēėÍ≤Ć žāī žąė žěąŽäĒ žßϞ̥ žßÄžĖīžēľ ŪĖąŽč§.
žĚīžóź ŽĒįŽĚľ Žāėžė® Í≤ÉžĚī Žā®ŪĖ•žßĎžĚīŽ©į, žĶúŽĆÄŪēú Žč®žóīÍ≥ľ Ž≥īžė® Ūö®Í≥ľŽ•ľ ŽÜížĚīÍłį žúĄŪēī žßÄŽ∂ēžĚė Ž™®žĖĎžĚÄ „ÖÖžěźŪėēžúľŽ°ú ŽßĆŽď§Í≥† ž≤ėŽßąŽ•ľ ÍłłÍ≤Ć ŪēėžėÄžúľŽ©į žßÄŽ∂ē žÜćžóźŽäĒ ŪĚôžĚĄ ŽĄ£žóąŽč§. Í∑łŽ¶¨Í≥† ž∂úžěÖŪēėŽäĒ Žā®ž™Ĺ Ž≤ĹžĚė žē쎨ł žôłžóź Ž≥ĄŽŹĄŽ°ú Ž∂Āž™Ĺ Ž©īžóź Ží∑Ž¨łžĚĄ ŽßƎ吏Ėī žó¨Ž¶ĄŽā†žóźŽäĒ žóīžĖīŽĎźžĖī žčúžõźŪēėÍ≤Ć ŪēėžėÄÍ≥†, Í≤®žöłžóźŽäĒ ÍĶ≥Í≤Ć ŽčęžēĄŽĎźžóąŽč§.
žßϞ̥ Žā®ŪĖ•žúľŽ°ú žßÄžĚÄ Í≤ÉžĚÄ ž∂Ēžöī Í≤®žöłžóź ŽāúŽį©žĚĄ žúĄŪēī žĶúŽĆÄŪēú ŪĖáŽ≥ēžĚĄ ŽßéžĚī ŽįõžēĄŽď§žĚīŽŹĄŽ°Ě ŪēėÍłį žúĄŪēú ŽįįŽ†§žĚīŽč§. žā¨ŽěĆžĚī žúĄžĻėŪēėŽäĒ ÍłįŽ≥ł Žį©ŪĖ•ŽŹĄ ŽįĚžĚÄ Žā®ž™ĹžĚĄ ŪĖ•ŪēėŽŹĄŽ°Ě ŪēėžėÄžúľŽ©į, ŽąĄžõĆ žě†žěźŽäĒ Ž®łŽ¶¨ žúĄž™ĹŽŹĄ Žā®ŪĖ•ŪēėŽŹĄŽ°Ě ŪēėžėÄŽč§. ŽįĚžĚƞ̥ žą≠žÉĀŪēėŽäĒ „Ä鞣ľžó≠„ÄŹžĚė Śīáśėé(žą≠Ž™Ö)žā¨žÉĀžĚÄ ŚúįŚúĖ ž†úžěĎ ŽėźŪēú Žā®ž™ĹžĚĄ žúĄŽ°ú Ūēėžó¨ Í∑łŽ†łŽč§.
žĚīŽ†áÍ≤Ć ŽźėŽ©ī žěźžóįŪěą žēĄŽěėž™ĹžĚÄ Ž∂Āž™ĹžúľŽ°ú ŽďĪžßĄ Ž™®žäĶžĚī ŽźėÍ≥† žôľž™ĹžĚÄ ŽįĒŽ°ú ŪēīÍįÄ ŽĖ†žė§Ž•īŽäĒ ŽŹôž™ĹžĚī ŽźėÍ≥†, žė§Ž•łž™ĹžĚÄ ŪēīÍįÄ žßÄŽäĒ žĄúž™ĹžĚī ŽźúŽč§. žöĒž¶ė ŪēôÍĶźžóźžĄú ÍįÄŽ•īžĻėŽäĒ žĄúžĖĎžčĚ Žį©ŪĖ• ŪĎúžčúŽ≤ēÍ≥ľŽäĒ žôĄž†ĄŪěą ŽįėŽĆÄÍįúŽÖźžĚīŽč§. žĚīŽü¨Žč§Ž≥īŽčą žöįŽ¶¨žĚė Ž¨łŪôĒŽāė ŽúĽÍłÄžěźŽ•ľ žĚīŪēīŪēėŽäĒŽćį žē†Ž®ĻÍ≤Ć ŽźėŽäĒŽćį žöįŽ¶¨ Ž¨łŪôĒŽ•ľ ž†úŽĆÄŽ°ú žĚīŪēīŪēėŽ†§Ž©ī Ž®ľž†Ä Ś∑¶ťôĹŚŹ≥ťôį, Ś∑¶śĚĪŚŹ≥Ť•ŅžĚė ÍįúŽÖźžĚī ŽįĒŽ°ú žĄúžēľ ŪēúŽč§.
žĚĆžĖĎžė§ŪĖČžóź ŽĒįŽ•ł Ś∑¶ŚŹ≥žĚė ÍįúŽÖź
‚φ ŚŹ≥žĚė ŚŹ£ŽäĒ ŪēėŽäėžĚė ŽįĚžĚÄ žĖĎ(šłÄ)žóź ŽĆÄŪēú žĚĆžĚė ÍįúŽÖźžĚīŽč§. Í∑łŽü¨ŽĮÄŽ°ú ŚŹ£ŽäĒ žó¨Žü¨ ÍįÄžßÄŽ°ú žďįžĚīŽäĒŽćį žěÖ ŽėźŽäĒ ŽēÖ, ŪėĻžĚÄ žÉąžĚė ŽĎ•žßÄŽ°ú Ž≥īÍłįŽŹĄ ŪēúŽč§. ŽĎ•žßÄŽäĒ žßϞ̥ žĚėŽĮłŪēėŽäĒŽćį, žÉąŽāė žā¨ŽěĆžĚīŽāė žßĎžóź Žď§žĖīÍįą ŽēĆŽäĒ ŪēīÍįÄ žĄúž™ĹžúľŽ°ú ÍłįžöįŽäĒ ž†ÄŽÖĀ Ž¨īŽ†ĶžĚīŽĮÄŽ°ú ŚŹ£ŽäĒ žĚĆžĚė Žį©žúĄžĚł žĄúž™ĹžĚĄ ŽúĽŪēúŽč§. Ť•Ņ(žĄúŽÖė žĄú), ťÖČ(žą†Ž≥Ď žú†, žóīžßł žßÄžßÄ žú†), ŚÖĆ(žĄúŽį© ŪÉú), Ś¶ā(ÍįôžĚĄ žó¨) ŽďĪÍ≥ľ ÍįôžĚī ŚŹ£ÍįÄ Žď§žĖī žěąŽäĒ ͳĞ쟎吏ĚÄ ŽĆÄÍįú žĚĆÍ≥ľ ÍīÄŽ†®ŽźúŽč§. ŽĒįŽĚľžĄú ŚŹ£ÍįÄ Žď§žĖīÍįĄ ŚŹ≥(žė§Ž•łžöį)ŽäĒ žĄúž™ĹžĚĄ ŽúĽŪēúŽč§.
Í≥†ŽĆÄ ŽŹôžĖϞ󟞥úŽäĒ žĖīŽĎźžöī Ž∂Āž™ĹžĚĄ ŽďĪžßÄÍ≥† ŽįĚžĚÄ Žā®ž™ĹžĚĄ ŪĖ•ŪēėŽäĒ Í≤ɞ̥ Ū܆ŽĆÄŽ°ú Žį©žúĄŽ•ľ ž†ēŪĖąŽč§. Ž∂ĀžĚĄ ŽďĪžßÄÍ≥† Ž≥īŽ©ī žĘĆÍįÄ ŽŹôž™ĹžĚīÍ≥†, žöįŽäĒ žĄúž™ĹžĚł Ś∑¶śĚĪŚŹ≥Ť•ŅžĚė Žį©žúĄÍįÄ ž†ēŪēīžßĄŽč§. ŽėźŪēú žĘĆžĖĎžöįžĚĆžĚė ŽįįžĻėžĚīÍłįŽŹĄ ŪēėŽč§.
‚Ď° Ś∑¶žĚė Ś∑•žĚÄ Ś§©Śúį(šļĆ)ÍįÄ ŪēėŽāėŽ°ú ŪÜĶŪē®(šł®)žĚĄ ŽāėŪÉÄŽāīŽĮÄŽ°ú ž≤úžßÄÍłįžöīžĚī ÍĶźŪÜĶŪēėžó¨ ŽßĆŽ¨ľžĚī žÜĆžÉĚŪēėŽäĒ ŽīĄž≤†Í≥ľ žĚėŽĮłÍįÄ ŪÜĶŪēúŽč§. ŽīĄžĚÄ ŽįĚžĚÄ žĖĎžĚė ÍłįžöīžĚī ŽįúŪēėŽäĒ Í≥Ąž†ąžĚīÍ≥† Žį©žúĄžÉĀžúľŽ°úŽäĒ žôľŪ鳞̳ ŽŹôŽį©žóź žÜćŪēúŽč§. ŽĒįŽĚľžĄú Ś∑•žĚÄ žĖĎžĚė Žį©žúĄžĚł ŽŹôž™ĹžĚĄ žÉĀžßēŪēėŽ©į Ś∑•žĚī Žď§žĖīÍįĄ Ś∑¶(žôľ žĘĆ)ŽäĒ ŽŹôž™Ĺžóź ŪēīŽčĻŪēėŽäĒ Í≤ÉžĚīŽč§. Ś∑¶žôÄ ŚŹ≥žĚė Ś∑•Í≥ľ ŚŹ£žóźŽäĒ Ś∑¶ťôĹŚŹ≥ťôįžĚė žĚīžĻėÍįÄ ŽčīÍ≤® žěąŽč§. ťôĹŚÖąťôįŚĺĆžĚė žõźŽ¶¨žóź ŽĒįŽĚľ Ô¶īŤ≠įśĒŅ(žėĀžĚėž†ē) žēĄŽěė Žč§žĚĆ žĄúžóīžĚÄ Ś∑¶Ť≠įśĒŅžĚīŽ©į Í∑ł Žč§žĚĆžĚī ŚŹ≥Ť≠įśĒŅžĚīŽč§. ŚŹ≥Ť≠įśĒŅžĚĄ ŽÜíÍ≤Ć ŽĎźŽäĒ Í≤ÉžĚÄ žē장ú ž†ú59žě•žĚė ‚ÄėŚ∑¶ťĀĒśČŅśėé‚ÄôžĚė žĚėŽĮłÍįÄ ŽčīÍ≤® žěąÍłįŽŹĄ ŪēėŽč§.
ŽįėŽ©ī Í≥ĶŽ∂ÄŽ•ľ žĚĶŪ칎äĒ ŪēôžÉ̎吏óźÍ≤Ć žĄúž™ĹžĚÄ žôĄžĄĪžĚė Žč®Í≥ĄžĚīŽĮÄŽ°ú žĄúžõź(śõłťôĘ)žóźžĄú Íłįžąôžā¨Ž•ľ ŽįįžĻėŪē† ŽēĆ žĄúžě¨(Ť•ŅťĹč)ŽäĒ žĄ†ŽįįŽď§žĚė Žį©žĚī ŽźėÍ≥† ŽŹôžě¨(śĚĪťĹč)ŽäĒ žÉĚÍłį(ÁĒüśį£)Ž•ľ ŽįõžēĄŽď§žó¨ žĚĶŪ칎̾ŽäĒ žį®žõźžóźžĄú žč†žěÖžÉ̎吏Ěė Žį©žĚī ŽźúŽč§. Í∂ĀÍ∂źžóźžĄú ŪÉúžěźžĚė Í∂ĀžĚĄ ŽŹôž™Ĺžóź ŽĎźÍ≥† śĚĪŚģģžĚīŽĚľÍ≥† Ž∂ÄŽ•īŽäĒ Í≤ÉŽŹĄ ÍįôžĚÄ žĚīžĻėžĚīŽč§.
šļĒŤ°ĆžĚė žĚīžĻė
žė§ŪĖČžĚīŽěÄ žĚĆžĖĎžĚė śį£ťĀč(Íłįžöī)žĚī ŽīĄ žó¨Ž¶Ą ÍįĞ̥ Í≤®žöłžóź ŽĒįŽĚľ ŽēÖ žúĄžóź Í∑ł ŚĹĘŤ≥™(Ūėēžßą)žĚī Ž≤†ŪíÄžĖīžßÄŽäĒ žĚīžĻėŽ•ľ ŽāėŪÉÄŽāł ÍįúŽÖźžĚīŽč§. žīąŽ™©žĚī žčĻŪĄį žěźŽĚľŽäĒ Í≥Ąž†ąžĚł ŽīĄžĚĄ ŤćČśú®žĚė ÍłįžöīžĚī śóļÁõõ(žôēžĄĪ)ŪēėŽč§Í≥† Ūēėžó¨ śú®śóļšĻčÁĮÄ(Ž™©žôēžßÄž†ą), ŽćĒžöī žó¨Ž¶ĄžĚÄ Ž∂ąÍłįžöīžĚī žôēžĄĪŪēėŽč§Í≥† Ūēėžó¨ ÁĀęśóļšĻčÁĮÄ(ŪôĒžôēžßÄž†ą), žó¨Ž¶ĄžóźžĄú ÍįĞ̥Ž°ú ŽĄėžĖīÍįÄŽäĒ ž§ĎÍįĄžĚÄ ŽēÖžóź žěąŽäĒ ŽßĆŽ¨ľžĚī śąźÁÜüŪēėŽäĒ Í≥ľž†ēžĚīŽĮÄŽ°ú ŽēÖžĚė ÍłįžöīžĚī žôēžĄĪŪēėŽč§Í≥† Ūēėžó¨ ŚúüśóļšĻčÁĮÄ(Ū܆žôēžßÄž†ą), ÍįĞ̥žĚÄ ž∂Ēžöī Í≤®žöłžóź ŽĆÄŽĻĄŪēėžó¨ Žč®Žč®Ūěą žėĀÍłÄÍłįžóź Žč®Žč®Ūēú ÍłįžöīžĚī žôēžĄĪŪēėŽč§Í≥† Ūēėžó¨ ťáĎśóļšĻčÁĮÄ(ÍłąžôēžßÄž†ą), Í≤®žöłžĚÄ Ž¨ľ ÍłįžöīžĚī žěąŽäĒ Í≤ÉžĚÄ žĖľÍłįžóź śįīśóļšĻčÁĮÄ(žąėžôēžßÄž†ą)žĚīŽĚľÍ≥† ÍįúŽÖźŪôĒŪēėžėÄŽč§.
žĚīŽ•ľ Í≥Ąž†ąžĚė ÁĒüŤÄĆŚÖč(žÉĚžĚīÍ∑Ļ : ŽāėžôÄžĄú žĚīÍ≤®ŽāėÍįÄŽäĒ Í≥ľž†ē), Í≥ß ŽīĄ‚Üížó¨Ž¶Ą‚ÜížāľŽ≥Ķ(šłČšľŹ)‚ÜíÍįĞ̥‚ÜíÍ≤®žöłžĚė žĚīžĻėŽ°ú ŪĎúŪėĄŪēėŽ©ī śú®ÁĀęŚúüťáĎśįīžĚīŽč§.
žįłÍ≥†Ž°ú Ś≠£Ś§Ź(Í≥ĄŪēė)žĚł šłČšľŹžĚÄ Ś§ŹŤá≥(ŪēėžßÄ)Ž°úŽ∂ÄŪĄį žÖčžßł Śļöśó•(Í≤Ş̾)žĚł ŚąĚšľŹ(žīąŽ≥Ķ), ŽĄ∑žßł Í≤Ş̾žĚł šł≠šľŹ(ž§ĎŽ≥Ķ), Ôß∑Áßč(žěÖž∂Ē) ŪõĄ ž≤ęžßł Í≤Ş̾žĚł ŽßźŽ≥Ķ(śúęšľŹ)žĚĄ ŽßźŪēúŽč§. Ž≥ĶŽā†žĚÄ 10žĚľ ÍįĄÍ≤©žúľŽ°ú Žď§Íłį ŽēĆŽ¨łžóź žīąŽ≥ĶžóźžĄú ŽßźŽ≥ĶÍĻĆžßÄŽäĒ ŽĆÄž≤īŽ°ú 20žĚľžĚī ÍĪłŽ¶įŽč§. žĚīŽüī Í≤ĹžöįžĚė žāľŽ≥ĶžĚĄ śĮŹšľŹ(Žß§Ž≥Ķ)žĚīŽĚľ ŪēúŽč§. ŪēėžßÄŽßĆ ŽßźŽ≥ĶžĚÄ žěÖž∂Ē Ží§žĚė Í≤Ş̾žĚīÍłį ŽēĆŽ¨łžóź 20žĚľ ŽßĆžóź ŽßěžĚīŪē† žąė žěąŽč§. žĚīŽēĆŽäĒ Žč¨žĚĄ ÍĪīŽĄą Žď§žóąŽč§ Ūēėžó¨ Ť∂äšľŹ(žõĒŽ≥Ķ)žĚīŽĚľ ŪēúŽč§.
šļĒŤ°ĆžĚĄ śįīÁĀęśú®ťáĎŚúüŽĚľÍ≥† ŪĎúŪėĄŪēėŽäĒ Í≤ĹžöįŽŹĄ ŽßéžĚÄŽćį žĚīŽäĒ ŚÖčŤÄĆÁĒü(Í∑ĻžĚīžÉĚ)žĚė žĚīžĻėŽ°ú ŽßźŪēú Í≤ÉžĚīŽč§. Í∑ľžõźžĚł Ž¨ľžĚĄ ŽįĒŪÉēžúľŽ°ú Ūēėžó¨ žôēžĄĪŪēú ÍłįžöīžĚĄ Í∑ĻŽ≥ĶŪēīŽāīžēľ Í∑ł Žč§žĚĆ Žč®Í≥ĄŽ°ú ŽāėžēĄÍįĄŽč§ŽäĒ ŽúĽžĚłŽćį Á¶Ļ(žöį)žěĄÍłąžĚė ś≤Ľśįīś≥ēžúľŽ°ú „ÄéśõłÁ∂ď„ÉĽŚĎ®śõł(žĄúÍ≤Ĺ„ÉĽž£ľžĄú)„ÄŹ śī™ÁĮĄ(ŪôćŽ≤Ē)Ū鳞󟞥ú Žč§Ž§ĄžßĄ žė§ŪĖČžĻėžąėŽ≤ēžĚė žõźŽ¶¨žĚīžěź Ô§ēśõłšĻĚŚģģśēłÁźÜžĚė žĚīžĻėŽ°ú ž≤úŪēėŽ•ľ Žč§žä§Ž¶¨ŽäĒ Ś§ßÁ∂ߜ≥ēžĚė žĚīžĻėžĚīÍłįŽŹĄ ŪēėŽč§. žė§ŪĖČžĚė žąúžĄúŽäĒ ž†Āžö©ŪēėŽäĒ žā¨žēąžóź ŽĒįŽĚľ Í∑ł žąúžĄúŽ•ľ Žč¨Ž¶¨Ūēī žďįÍłįŽŹĄ ŪēúŽč§.
ŽėźŪēú ŪēúŽ¨łŽ¨łŪôĒÍ∂ƞ󟞥úŽäĒ Žč¨Ž†•žĚīŽāė žöīžĄł(ťĀčŚčĘ)žĚė Íłįž§ÄžúľŽ°ú žďįŽäĒ 60ŚĻ≤śĒĮ(ÍįĄžßÄ) ŽėźŪēú žĚĆžĖĎžė§ŪĖȞ󟞥ú ÍłįžõźŪēėÍ≥† žěąŽč§. ÍįĄžßĞ󟞥ú ťôŞ̥ ŽĆÄŪĎúŪēėŽäĒ ŪēėŽäėžĚė žöīŪĖȞ̥ Ś§©ŚĻ≤žĚīŽĚľ ŪēėÍ≥†, ťôįžĚĄ ŽĆÄŪĎúŪēėŽäĒ ŽēÖžĚė žöīŪĖȞ̥ ŚúįśĒĮŽĚľÍ≥† ŪēúŽč§. ž≤úÍįĄÍ≥ľ žßÄžßÄŽäĒ 10ŚĻ≤Í≥ľ 12śĒĮŽ°ú, ÁĒ≤šĻôšłôšłĀśąäŚ∑ĪŚļöŤĺõŚ£¨Áôł(ÍįϞ̥Ž≥Ďž†ēŽ¨īÍłįÍ≤Ş膞ěĄÍ≥Ą)žôÄ Ś≠źšłĎŚĮÖŚćĮŤĺįŚ∑≥Śćąśú™ÁĒ≥ťÖČśąĆšļ•(žěźž∂ēžĚłŽ¨ėžßĄžā¨žė§ŽĮłžč†žú†žą†Ūēī)Ž•ľ ŽßźŪēúŽč§.
10ÍįúžĚė Ś§©ŚĻ≤Í≥ľ 12ÍįúžĚė ŚúįśĒĮŽ•ľ žÉĀŪėł ŽįįŪē©ŪēīžĄú Žāėžė® Í≤ÉžĚī 60ÍįĄžßÄžĚīŽč§. žó¨Íłįžóź 24ž†ąÍłįŽ•ľ ŽćĒŪēī ŪÉúžĖĎŽ†•Í≥ľ ŪÉúžĚĆŽ†•žĚė ž°įŪôĒŽ•ľ žĚīŽ§Ą ŽąĄÍĶ¨Žāė žēĆÍłį žČ¨žöī Žč¨Ž†•žĚĄ šłäŚŹ§žčúŽĆÄ ŽēĆŽ∂ÄŪĄį žć®žôĒŽč§ŽäĒ ž†źžĚīŽč§. žĚīŽ†áŽďĮ ŪēúŽ¨łŽ¨łŪôĒÍ∂ĆžĚė žó≠žā¨žôÄ Ž¨łŪôĒ, ÍįÄžĻėÍīĞ̥ žĚīŪēīŪēėÍłį žúĄŪēīžĄ† ŽįėŽďúžčú žĚĆžĖĎžė§ŪĖȞ̥ žēĆžēĄžēľ ŪēėŽ©į žĚĆžĖĎžė§ŪĖȞ̥ žēĆÍłį žúĄŪēīžĄ† ŽúĽÍłÄžěźžĚł ŪēúŽ¨łžĚĄ ž†úŽĆÄŽ°ú žĚĶŪėÄžēľ ŪēúŽč§.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