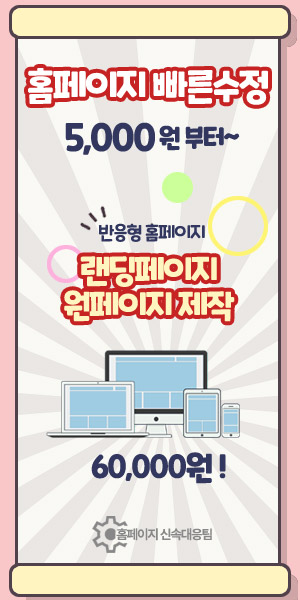мһ‘лӘ…лІ•мқҳ н•ҷмҲ м Ғ мІҙкі„нҷ”, 'нӣҲлҜјм •мқҢ мҳӨн–үм„ұлӘ…', 'нӣҲлҜјм •мқҢ (лӘЁмһҗмқҢ) мҳӨн–үм„ұлӘ…' #к№Җл§ҢнғңкөҗмҲҳ #мһ‘лӘ… #мӮ¬мЈјлӘ…лҰ¬ #нӣҲлҜјм •мқҢ #мҳӨвҖҰ
Page info
Writer Date25-06-12 00:00 Hit23 Comment0Link
-
 https://youtu.be/TyHakfBn1Io
5- Connection
https://youtu.be/TyHakfBn1Io
5- Connection
Body


мһ‘лӘ…лІ•мқҳ н•ҷмҲ м Ғ мІҙкі„нҷ”, 'нӣҲлҜјм •мқҢ мҳӨн–үм„ұлӘ…', 'нӣҲлҜјм •мқҢ (лӘЁмһҗмқҢ) мҳӨн–үм„ұлӘ…' #к№Җл§ҢнғңкөҗмҲҳ #мһ‘лӘ… #мӮ¬мЈјлӘ…лҰ¬ #нӣҲлҜјм •мқҢ #нӣҲлҜјм •мқҢмҳӨн–үм„ұлӘ… #лӘЁмһҗмқҢмҳӨн–ү #мһ‘лӘ…мҶҢ
кІҪл¶ҒлҢҖн•ҷкөҗ нҸүмғқкөҗмңЎмӣҗ 'м •м„ 'мӮ¬мЈјлӘ…лҰ¬ к°•мўҢ
https://namestory.kr/bbs/board.php?bo_table=sub3_1\u0026wr_id=212
к№Җл§ҢнғңкөҗмҲҳ мӮ¬мЈјмһ‘лӘ…мӣҗ https://namestory.kr
к№Җл§ҢнғңкөҗмҲҳ нӣҲлҜјм •мқҢ мҳӨн–үм„ұлӘ… https://blog.naver.com/ware4u
#мӮ¬мЈј #мӮ¬мЈјнҢ”мһҗ #мӮ¬мЈјлӘ…лҰ¬ #лӘ…лҰ¬н•ҷ #к№Җл§Ңнғң #к№Җл§ҢнғңкөҗмҲҳ #추м Ғ60분
#мҡҙлӘ… #мҢҚл‘Ҙмқҙ #мһ‘лӘ… #к°ңлӘ… #мһ‘лӘ…мҶҢ #мІ н•ҷкҙҖ #мң лӘ…н•ңмһ‘лӘ…мҶҢ #мң лӘ…н•ңмІ н•ҷкҙҖ
ліё лӮҙмҡ©мқҳ мӣҗл¬ёмқҖ к№Җл§Ңнғң көҗмҲҳлӢҳмқҳ KCI н•ҷмҲ л…јл¬ё,
пҪўнҳ„лҢҖ н•ңкөӯмӮ¬нҡҢмқҳ мқҙлҰ„짓기 (мһ‘лӘ…) мҡ”кұҙм—җ кҙҖн•ң кі м°°пҪЈ (мў…көҗм—°кө¬ м ң65집, 2011л…„ 12мӣ”)кіј (н•ңкөӯлҜјмҶҚн•ҷ м ң62집, 2015л…„ 11мӣ”),
гҖҢнӣҲлҜјм •мқҢ лӘЁмһҗмқҢ(жҜҚеӯҗйҹі)мҳӨн–үмқҳ м„ұлӘ…н•ҷм Ғ м Ғмҡ© м—°кө¬гҖҚ(лҸҷл°©л¬ёнҷ”мҷҖ мӮ¬мғҒ м ң6집, 2019л…„ 2мӣ”)кіј (лҜјмЎұмӮ¬мғҒ м ң14к¶Ң м ң3нҳё, 2020л…„ 12мӣ”) л“ұм—җ мҲҳлЎқлҗҳм–ҙ мһҲмҠөлӢҲлӢӨ.
мқҙлҰ„мқҖ мӮ¬лһҢмқҳ м„ұ м•„лһҳм—җ л¶ҷм—¬ лӢӨлҘё мӮ¬лһҢкіј кө¬лі„н•ҳм—¬ л¶ҖлҘҙлҠ” л§җмқҙмһҗ м„ұкіј мқҙлҰ„мқ„ м•„мҡёлҹ¬ мқҙлҘҙлҠ” л§җмқҙкё°лҸ„ н•ҳлӢӨ. мӮ¬лһҢмқҖ лҲ„кө¬лӮҳ мһҗмӢ мқҳ мқҙлҰ„мқ„ к°–кі мһҲмңјл©° к·ё мқҙлҰ„мқҖ нҸүмғқ лҸҷм•Ҳ лӢӨлҘё мӮ¬лһҢл“Өм—җкІҢ л¶ҲлҰ¬м–ҙм§Җл©ҙм„ң мқҙлҰ„ мЈјмқёкіө мҰү ліёлӘ…мқё(жң¬еҗҚдәә)м—җ лҢҖн•ң мқёмғҒ(еҚ°иұЎ)мқ„ мўҢмҡ°н•ңлӢӨ.
мҳҲлҘј л“Өл©ҙ н•ңкөӯмқҳ лҢҖн‘ңм Ғ нҢЁм…ҳл””мһҗмқҙл„ҲлЎң нҷңм•Ҫн–ҲлҚҳ вҖҳм•ҷл“ңл Ҳк№ҖвҖҷмқҳ кІҪмҡ° ліёлһҳ мқҙлҰ„мқҙ вҖҳк№ҖлҙүлӮЁвҖҷмқёлҚ°, вҖҳм•ҷл“ңл Ҳк№ҖвҖҷмқҙлһҖ мқёл¬јмқҙ к°–кі мһҲлҠ” мһ¬лҠҘкіј мһ мһ¬лҠҘл ҘмқҖ к°ҷм•ҳм§Җл§Ң л§Ңм•Ҫ мһҗмӢ мқҳ мқҙлҰ„мқ„ вҖҳм•ҷл“ңл Ҳк№ҖвҖҷмқҙлқј мӮ¬мҡ©н•ҳм§Җ м•Ҡкі , вҖҳк№ҖлҙүлӮЁвҖҷмқҙлқј кі„мҶҚ мӮ¬мҡ©н–ҲлҚ”лқјл©ҙ кіјм—° вҖҳм•ҷл“ңл Ҳк№ҖвҖҷмқҙлқј л¶ҲлҰҙ л•Ңл§ҢнҒј мӮ¬нҡҢм ҒмңјлЎң нҒ¬кІҢ м„ұкіөн• мҲҳ мһҲм—Ҳмқ„к№Ң? м•„л§ҲлҸ„ к·ёл Үм§Җ м•Ҡм•ҳмқ„ к°ҖлҠҘм„ұмқҙ нӣЁм”¬ лҚ” лҶ’лӢӨ.
мқҙмІҳлҹј мқҙлҰ„мқҖ лӢЁмҲңнһҲ лӘҮ мқҢм Ҳмқҳ лӢЁм–ҙм—җ к·ём№ҳлҠ” кІғмқҙ кІ°мҪ” м•„лӢҲлқј мӮ¬нҡҢл¬ёнҷ”м ҒмңјлЎң мһҗкё° мЎҙмһ¬мқҳ лҳҗ лӢӨлҘё лӘЁмҠөмңјлЎң мӨ‘мҡ”н•ң м—ӯн• мқ„ н•ңлӢӨ. к·ёлҹ¬лҜҖлЎң мқҙлҰ„ мҰү м„ұлӘ…(姓еҗҚ)м—җлҠ” м–ём–ҙн•ҷм Ғ кҙҖм җмңјлЎңл§Ң мқҙн•ҙн•ҳкі м ‘к·јн• мҲҳ м—ҶлҠ” к·ё л¬ҙм–ёк°Җк°Җ мһҲмқ„ кІғмқҙлқјлҠ” м¶”лЎ лҸ„ 충분нһҲ к°ҖлҠҘн•ҳлӢӨ.
лҚ”кө¬лӮҳ нғҖмқём—җкІҢ 비춰м§Җкі л°–мңјлЎң ліҙмқҙм§ҖлҠ” мҷёнҳ•мқ„ мӨ‘мҡ”н•ҳкІҢ м—¬кё°лҠ” нҳ„лҢҖмӮ¬нҡҢм—җм„ңмқҳ н•ңкөӯмқёл“ӨмқҖ м„ұнҳ•(жҲҗеҪў)мқ„ нҶөн•ҙ мһҗмӢ мқҳ мҷёлӘЁлҘј лҚ” м•„лҰ„лӢөкІҢ кі м№ҳл“Ҝмқҙ к°ңлӘ…(ж”№еҗҚ)мқ„ нҶөн•ҙ мһҗмӢ мқҳ мқҙлҰ„мқ„ лҚ” м„ёл Ёлҗҳкі мўӢкІҢ л°”кҫёл ӨлҠ” кІҪн–ҘлҸ„ к°•н•ҳлӢӨ. мқҙм—җ л”°лқј мөңк·ј н•ңкөӯмӮ¬нҡҢм—җм„ңлҠ” к°ңлӘ… м—ҙн’Қмқҙ м„ём°ЁкІҢ л¶Ҳкі мһҲлӢӨ.
мҳӨлҠҳлӮ мҡ°лҰ¬к°Җ мӮҙкі мһҲлҠ” мқҙ м§Җкө¬мғҒм—җлҠ” мҲҳл§ҺмқҖ лҜјмЎұкіј л¶ҖмЎұ, к·ёлҰ¬кі лӢӨм–‘н•ң л¬ёнҷ”мҷҖ мғқнҷң л°©мӢқмқҙ кіөмЎҙн•ңлӢӨ. м•„мқҙлҘј лӮікі кё°лҘҙлҠ” м¶ңмӮ° л°©мӢқкіј мңЎм•„лІ• м—ӯмӢң л§Ҳм°¬к°Җм§ҖмқҙлӢӨ. мң лҹҪмқ„ 비лЎҜн•ң м•„мӢңм•„, м•„н”„лҰ¬м№ҙ, лҜёмЈј л“ұм§Җм—җлҠ” м ңк°Ғкё° лҸ…м°Ҫм Ғмқҙлқј м—¬кІЁм§ҖлҠ” м¶ңмӮ°кіј мңЎм•„ н’ҚмҶҚлҸ„ м Ғм§Җ м•ҠлӢӨ.
к·ёлҹ¬лӮҳ мӢ мғқм•„мқҳ мқҙлҰ„мқ„ 짓лҠ” мқјмқҖ м–ҙлҠҗ мӮ¬нҡҢмқҙл“ л§Өмҡ° мӨ‘мҡ”н•ҳкІҢ м—¬кёҙлӢӨ. мқҙлҰ„мқ„ к°–кІҢ лҗҳл©ҙ 비лЎңмҶҢ лҸ…лҰҪм Ғмқё к°ңмІҙ, к·ёлҰ¬кі мҶҢмҶҚ кіөлҸҷмІҙмқҳ мқјмӣҗмқҙ лҗҳлҠ” кІғмқҙлҜҖлЎң мһ‘лӘ…мқҖ кі§ мӮ¬нҡҢм Ғ нғ„мғқмқ„ мқҳлҜён•ңлӢӨ. м¶ңмӮ°мқҙ мғқл¬јм Ғ нғ„мғқмқҙлқјл©ҙ мһ‘лӘ…мқҖ мӮ¬нҡҢм Ғ нғ„мғқмқҙлӢӨ.
н”„лһ‘мҠӨ лҢҖнҳҒлӘ… мқҙнӣ„, мң лҹҪмқҳ кё°лҸ…көҗмқёл“ӨмқҖ мҳҒм„ё(baptism)лҘј мӨ‘мӢңн•ҳм—¬ м„ёлЎҖлӘ…мқ„ мқҙлҰ„мңјлЎң мӮ¬мҡ©н•ҳлҠ” кІҪмҡ°к°Җ л§Һм•ҳлӢӨ. м„ұмқё(иҒ–дәә)мқҳ мқҙлҰ„мқ„ л”ҙ м„ёлЎҖлӘ…мқ„ мӨ‘мӢңн•ҳкІҢ лҗң мқҙмң лҠ” к·ё м„ұмқёмқҙ м•„кё°лҘј ліҙнҳён•ҙ мӨҖлӢӨкі лҜҝм—Ҳкё° л•Ңл¬ёмқҙм—ҲлӢӨ. л¬јлЎ мқҙлҹ¬н•ң мҲҳнҳём„ұмқёмқҳ мӢ м•ҷмқҖ м„ұмқёмқҳ мҲҳнҳёлҘј кё°мӣҗн•Ёкіј м•„мҡёлҹ¬ к·ёмқҳ лҚ•м„ұмқ„ кұ°мҡёлЎң мӮјлҠ”лӢӨлҠ” мқҳлҜёлҸ„ к°–лҠ”лӢӨ.
мқҙм ң н•өк°ҖмЎұ мӢңлҢҖк°Җ лҗҳл©ҙм„ң м•„кё°лҠ” м җм җ нқ”м№ҳ м•ҠмқҖ мҶҢмӨ‘н•ң мЎҙмһ¬к°Җ лҗҳм–ҙ, лҚ”мҡұ к°ңлі„м Ғмқё мЎҙмһ¬лЎң л¶Җк°Ғлҗҳкі мһҲлӢӨ. л”°лқјм„ң л¶ҖлӘЁл“ӨмқҖ к°ҖлҠҘн•ң н•ң лҸ…м°Ҫм Ғмқҙкі м„ёл Ёлҗҳл©° мўӢмқҖ мқҙлҰ„мқ„ м§Җм–ҙмЈјкі мһҗ м• м“ҙлӢӨ.
лӘ…лҰ¬н•ҷм ҒмңјлЎң мўӢмқҖ мқҙлҰ„мқҙлһҖ мқҙлҰ„ мЈјмқёкіөм—җкІҢ л§һлҠ” мўӢмқҖ кё°мҡҙмқ„ м§ҖлӢҢ мқҙлҰ„мқҙлӢӨ. мқҙлҰ„мқҖ нӣ„мІңм ҒмңјлЎң 갖추лҠ” мҡ”мҶҢмқҙлӢӨ. к·ёлҹ¬лҜҖлЎң мқҙлҰ„ мЈјмқёкіөмқҙ м„ мІңм ҒмңјлЎң к°–кі нғңм–ҙлӮң кё°мҡҙ, мҰү мқҢм–‘мҳӨн–үкіј н•ңлӮңмЎ°мҠө(еҜ’жҡ–зҮҘжҝ•: мҳЁлҸ„мҷҖ мҠөлҸ„)мқ„ ліҙмҷ„н•ҙм„ң мӨ‘нҷ”(дёӯе’Ң)лҘј мқҙлЈЁлҸ„лЎқ н•ҳлҠ” мқҙлҰ„мқҙ к°ҖмһҘ мўӢмқҖ мқҙлҰ„мқҙлӢӨ. к·ёлҰ¬кі л¶ҖлҘҙкё° мүҪкі л“Јкё° мўӢмңјл©°, мӢңлҢҖм—җ л§һкі л„Ҳл¬ҙ нқ”н•ҳм§Җ м•Ҡм•„м•ј н•ңлӢӨ.
мӮ¬лһҢл“Өмқҙ нҳ„м„ём—җм„ң н–үліөмқ„ мҶҢл§қн•ҳкі кө¬н•ҳлҠ” кІғмқҖ мқёк°„мқҳ ліём„ұмқҙмһҗ мқёмғқмқҳ мөңмғҒ лӘ©н‘ңмқҙлӢӨ. мІ н•ҷкіј мў…көҗм—җм„ңлҠ” л§ҲмқҢ мҲҳм–‘кіј лҸ„лҚ•м Ғ м„ұмҲҷмқҙ н–үліөмқҳ м§ҖлҰ„кёёмқҙлқјкі к°•мЎ°н•ҳм§Җл§Ң лҢҖл¶Җ분 мӮ¬лһҢл“ӨмқҖ вҖҳмҲҳ(еЈҪ), л¶Җ(еҜҢ), к·Җ(иІҙ)вҖҷлқјлҠ” м§Җк·№нһҲ м„ёмҶҚм Ғмқё кІғм—җм„ң н–үліөмқ„ лҠҗлӮҖлӢӨ. мқҙм—җ л”°лқј мқҙлҰ„мқҖ мһҗмӢ мқ„ лӢӨлҘё мӮ¬лһҢкіј кө¬лі„н•ҳкё° мң„н•ҙ л¶ҖлҘҙлҠ” нҳём№ӯл¶ҖнҳёлқјлҠ” ліёлһҳмқҳ мқҳлҜёлҘј л„ҳм–ҙм„ң мӮ¬лһҢкіј мҡҙлӘ… к°„м—җ кіөлӘ…(е…ұйіҙ) мһ‘мҡ©мқ„ н•ңлӢӨкі мқёмӢқлҗҳм—ҲлӢӨ.
гҖҺм„ұкІҪ(the Bible)гҖҸкіј гҖҺм–‘м•„лЎқ(йӨҠе…’йҢ„)гҖҸм—җ л“ұмһҘн•ҳлҠ” мһ‘лӘ…кіј к°ңлӘ… мӮ¬лЎҖл“Өмқҙ мқҙлҘј мһҳ л§җн•ҙмӨҖлӢӨ. н•ҳлҠҗлӢҳ(м•јнӣј)мқҖ м°ҪмЎ° н–үмң„мқҳ мқјнҷҳмңјлЎң м§Ғм ‘, нҳ№мқҖ мһҗмӢ мқҳ мӮ¬мһҗ(дҪҝиҖ…)лҘј нҶөн•ҙ лӢ№мӮ¬мһҗм—җкІҢ мқҙлҰ„мқ„ л¶Җм—¬н•ҳкұ°лӮҳ кё°мЎҙ мқҙлҰ„мқ„ л°”кҫёлҠ” к°ңлӘ…мқ„ н–үн•ҳмҳҖлҠ”лҚ°, мқҙлҠ” к·ё лӢ№мӮ¬мһҗм—җкІҢ н•©лӢ№н•ң мӮ¬лӘ…мқ„ л¶Җм—¬н•ҳкё° мң„н•Ёмқҙм—ҲлӢӨ.
н•ҳлҠҗлӢҳмқҙ м•„лёҢлһҢмқ„ вҖҳл§ҺмқҖ лҜјмЎұмқҳ мЎ°мғҒмқҙ лҗҳлқјвҖҷлҠ” мқҳлҜёлЎң м•„лёҢлқјн•ЁмңјлЎң к°ңлӘ…н•ҳкі (м°Ҫм„ёкё° 17мһҘ 5м Ҳ), м•„лёҢлқјн•Ёмқҳ м•„лӮҙ мӮ¬лһҳлҘј вҖҳл§ҺмқҖ лҜјмЎұмқҳ м–ҙлҜёк°Җ лҗҳлқјвҖҷлҠ” мқҳлҜёлЎң мӮ¬лқјлЎң к°ңлӘ…н•ҳкі (м°Ҫм„ёкё° 17мһҘ 15м Ҳ), вҖҳн•ҳлҠҗлӢҳкіј кІЁлЈЁм–ҙ лғҲкі мӮ¬лһҢкіјлҸ„ кІЁлЈЁм–ҙ мқҙкёҙ мӮ¬лһҢвҖҷмқҙлһҖ лң»мңјлЎң м•јкіұмқ„ мқҙмҠӨлқјм—ҳлЎң к°ңлӘ…н•ҳкі (м°Ҫм„ёкё° 32мһҘ 29м Ҳ), вҖҳ(м•јнӣј) лӢ№мӢ мқҙ мӮ¬лһ‘н•ҳлҠ” м•„мқҙвҖҷлқјлҠ” лң»мңјлЎң мҶ”лЎңлӘ¬м—җкІҢ м—¬л””л””м•јлқјлҠ” мғҲлЎңмҡҙ мқҙлҰ„мқ„ мЈјкі (мӮ¬л¬ҙм—ҳн•ҳ 12мһҘ 25м Ҳ), мҰҲк°ҖлҰ¬м•јм—җкІҢ м•„л“Өмқҙ нғңм–ҙлӮҳмһҗ м„ёлЎҖмһҗмқё мҡ”н•ңмқҙлқјкі мқҙлҰ„ н•ҳкІҢ н•ң(лҲ„к°ҖліөмқҢ 1мһҘ 13м Ҳ) кё°лЎқл“Өмқҙ мһҲлӢӨ. мҳҲмҲҳк°Җ мӢңлӘ¬мқ„ вҖҳл°”мң„вҖҷлқјлҠ” лң»мқҳ лІ л“ңлЎң(кІҢнҢҢ)лЎң мқҙлҰ„мқ„ л°”кҫёкұ°лӮҳ(мҡ”н•ңліөмқҢ 1мһҘ 42м Ҳ), м ңлІ лҢҖмҳӨмқҳ м•„л“Ө м•јкі ліҙмҷҖ к·ёмқҳ лҸҷмғқ мҡ”н•ңм—җкІҢ вҖҳмІңл‘Ҙмқҳ м•„л“ӨвҖҷмқҙлһҖ лң»мңјлЎң ліҙм•„л„ӨлҘҙкІҢмҠӨлқјлҠ” мқҙлҰ„мқ„ мғҲлЎң л¶ҷмқё(л§Ҳк°ҖліөмқҢ 3мһҘ 16м Ҳ) кё°лЎқлҸ„ мһҲлӢӨ.
гҖҺм–‘м•„лЎқгҖҸмқҖ мЎ°м„ м „кё° мқҙл¬ёкұҙ(п§Ўж–ҮжҘ—)мқҙ мҶҗмһҗ мқҙмҲҳлҙү(п§Ўе®Ҳе°Ғ)мқҙ нғңм–ҙлӮң 1551л…„л¶Җн„° 1566л…„к№Ңм§Җ м–‘мңЎн•ҳлҠ” кіјм •мқ„ кё°мҲ н•ң нҳ„мЎҙ мөңкі (жңҖеҸӨ)мқҳ мңЎм•„мқјкё°мқҙлӢӨ. мһҗмҶҗмқҙ к·Җн•ң 집м•Ҳм—җм„ң 58м„ём—җ мҶҗмһҗлҘј ліё н• м•„лІ„м§Җк°Җ мҶҗмһҗмқҳ л¬ҙлі‘мһҘмҲҳмҷҖ лІҲм„ұмқ„ к°„м ҲнһҲ кё°мӣҗн•ҳл©° 진мӢ¬кіј м• м •мңјлЎң кё°лЎқн•ң кёҖмқҙлӢӨ. мқҙл¬ёкұҙмқҖ к°Җм •(еҳүйқ–) 30л…„ мӢ н•ҙ(иҫӣдәҘ, 1551)л…„ м •мӣ” мҙҲ5мқј кі„мӮ¬(зҷёе·і)мӢңм—җ мҶҗмһҗк°Җ нғңм–ҙлӮҳмһҗ вҖҳм„ұмһҘн•ҳл©ҙ кёё(еҗү)н•ҳлқјвҖҷкі мҲҷкёё(ж·‘еҗү)мқҙлқј мқҙлҰ„мқ„ м§Җм—ҲлӢӨк°Җ нӣ—лӮ кёё(еҗү)мһҗлҘј кі°кі°мқҙ мғқк°Ғн•ҙліҙлӢҲ мў…мӮ¬мў…кө¬(еҫһеЈ«еҫһеҸЈ)лқј мҳӨн–үмғҒмғқ(дә”иЎҢзӣёз”ҹ)мқҳ лң»мқҙ м•„лӢҲлҜҖлЎң вҖҳн•ҷл¬ё(еӯёе•Ҹ)мқ„ 추кө¬н•ҳм—¬лқј.вҖҷлқјлҠ” мқҳлҜёлЎң мӨҖмҲҷ(йҒөеЎҫ)мқҙлқј к°ңлӘ…н•ҳл©°, лӢӨм„Ҝ лІҲ мӮ°(зӯӯ)к°Җм§ҖлҘј 집мңјлӢҲ л„Ө лІҲмқҙлӮҳ мҲҳлҙү(е®Ҳе°Ғ)мқҙ лӮҳмҷҖм„ң мҲҳлҙү(е®Ҳе°Ғ)мңјлЎң лӢӨмӢң к°ңлӘ…мқ„ н•ң мӮ¬лЎҖлҘј кё°лЎқн•ҳмҳҖлӢӨ.
мӮ¬лһҢмқҖ лҲ„кө¬лӮҳ нғңм–ҙлӮҳл©ҙм„ң м–ҙл–Ө нҳ•нғңлЎңл“ мһҗмӢ мқҳ мқҙлҰ„мқ„ к°–кІҢ лҗңлӢӨ. к·ё мқҙлҰ„мқҖ нҸүмғқ лҸҷм•Ҳ лӢӨлҘё мӮ¬лһҢл“Өм—җкІҢ л¶ҲлҰ¬м–ҙм§Ҳ лҝҗл§Ң м•„лӢҲлқј нӣ„м„ёк№Ңм§Җ л¶Ҳлҹ¬м§Җкё°лҸ„ н•ңлӢӨ. к·ёлҹ¬лҜҖлЎң мқҙлҰ„мқҖ лӢЁмҲңнһҲ лӘҮ мқҢм Ҳмқҳ лӢЁм–ҙм—җ л¶Ҳкіјн•ң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мһҗкё° мЎҙмһ¬мқҳ лҳҗ лӢӨлҘё лӘЁмҠөмңјлЎң мӨ‘мҡ”н•ҳкІҢ мһ‘мҡ©н•ңлӢӨ.
мқҙлҰ„мқҖ мўӢмқҖ лң»мқ„ лӢҙм•„м„ң л¶ҖлҘҙкё° мүҪкі л“Јкё° мўӢкІҢ 짓лҠ” кІғмқҙ кё°ліё мӣҗм№ҷмқҙлӢӨ. мқҙм—җ лҚ”н•ҳм—¬ мһ‘лӘ…к°Җл“ӨмқҖ мқҢм–‘, мҳӨн–ү, мӮ¬мЈј, мҲҳлҰ¬, м—ӯмғҒ л“ұмқҳ мҡ”кұҙлҸ„ н•Ёк»ҳ м°ёкі н•ҙм„ң кёён•ң мқҙлҰ„мқ„ м§“кі мһҗ н•ңлӢӨ. к·ёлҹ¬лӮҳ мһ‘лӘ…к°Җл“Өл§ҲлӢӨ мһ‘лӘ…н•ҳлҠ” л°©лІ•кіј кё°мӨҖмқҙ лӢӨлҘё кІҪмҡ°к°Җ л§Һм•„ к°ҷмқҖ мӮ¬лһҢ, к°ҷмқҖ мқҙлҰ„мқ„ л‘җкі м„ңлҸ„ к·ё кёёнқү нҢҗлӢЁмқҙ м„ңлЎң лӢӨлҘё кІҪмҡ°к°Җ л№ҲлІҲн•ҳлӢӨ.
мқҙлҹ° мғҒнҷ©мқҖ кІ°көӯ м„ұлӘ…н•ҷм—җ лҢҖн•ң л¶ҲмӢ л§Ң к°ҖмӨ‘мӢңнӮӨлҠ” мҡ”мқёмқҙ лҗҳкі мһҲлӢӨ. к·ёлҹ¬лҜҖлЎң мҳӨлҠҳлӮ н•ңкөӯ мӮ¬нҡҢм—җм„ң л„җлҰ¬ нҷңмҡ©лҗҳкі мһҲлҠ” мһ‘лӘ…лІ•л“Өмқҳ мһ‘лӘ… кё°мӨҖкіј мҡ”кұҙл“Өмқ„ кІҖнҶ н•ҙм„ң, нҳ„н–ү мһ‘лӘ…лІ•л“Өмқҙ м§ҖлӢҢ л¬ём ңм җл“Өмқ„ 분м„қ к·ңлӘ…н•ң нӣ„, мҳ¬л°”лҘё н•ҷмҲ м Ғ кҙҖм җкіј м°Ёмӣҗм—җм„ң к·ё н•ҙкІ°л°©м•Ҳмқ„ м—°кө¬н•ҙм„ң м ңм•Ҳн• н•„мҡ”м„ұмқҙ л§Өмҡ° нҒ¬лӢӨ. мқҙм—җ лҢҖн•ҙ ліё м—°кө¬м—җм„ңлҠ” көӯліҙ м ң70нҳёмқҙмһҗ м„ёкі„кё°лЎқл¬ёнҷ”мң мӮ°мқё гҖҺнӣҲлҜјм •мқҢгҖҸмқҳ м°Ҫм ң мқҙм№ҳм—җ л”°лқј (к·јкұ°н•ҳм—¬) н•ңкёҖмқҳ мҙҲм„ұмһҗмқҢлҝҗ м•„лӢҲлқј вҖҳмў…м„ұмһҗмқҢвҖҷкіј вҖҳмӨ‘м„ұлӘЁмқҢвҖҷмқҳ мқҢм–‘мҳӨн–үк№Ңм§Җ кі л Өн•ҳм—¬ мһ‘лӘ…н•ҳлҠ” вҖҳнӣҲлҜјм •мқҢ мҳӨн–үм„ұлӘ…вҖҷмқ„ м—°кө¬н•ҳкі м°Ҫм•Ҳн•ҙм„ң м—¬лҹ¬ м ңлҸ„к¶Ң н•ҷкі„м—җ л°ңн‘ңн•ҳмҳҖкі , кІҖмҰқк№Ңм§Җ мқҙлҜё мҷ„лЈҢн•ҳмҳҖлӢӨ.
нҳ„мһ¬ м„ұлӘ…н•ҷм ҒмңјлЎң мўӢмқҖ мқҙлҰ„мқ„ м§Җмңјл ӨлҠ” мӮ¬нҡҢм Ғ мҲҳмҡ”лҠ” л§Өмҡ° нҒ° лҚ° л°ҳн•ҙ, кё°мЎҙ мһ‘лӘ…лІ•м—җлҠ” кІ°м •м Ғмқҙкі м№ҳлӘ…м Ғмқё лӘЁмҲңмқҙ л„Ҳл¬ҙ л§Һмңјл©°, м„ұлӘ…н•ҷлҸ„ н•ҷмҲ м Ғ мІҙкі„лҘј мҳ¬л°”лЎң м •лҰҪн•ҳм§Җ лӘ»н•ҳкі мһҲлӢӨ. лҠҰм—Ҳм§Җл§Ң мқҙм ңл¶Җн„°лқјлҸ„ нҳ„н–ү мһ‘лӘ…лІ•кіј м„ұлӘ…н•ҷм—җ лҢҖн•ҙ н•ҷмҲ м Ғ, мІҙкі„м ҒмңјлЎң м—°кө¬н•ҳкі л¶„м„қн•ң, 'нӣҲлҜјм •мқҢ мҳӨн–үм„ұлӘ…'мқҙ нҳ„лҢҖ мӮ¬лһҢл“Өмқҙ н–үліөн•ң мӮ¶мқ„ мӢӨнҳ„н•ҳлҠ”лҚ° ліё м—°кө¬к°Җ нҒ° ліҙнғ¬мқҙ лҗҳкі лҸ„мӣҖмқҙ лҗ мҲҳ мһҲкё°лҘј 진мӢ¬мңјлЎң л°”лһҖлӢӨ.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