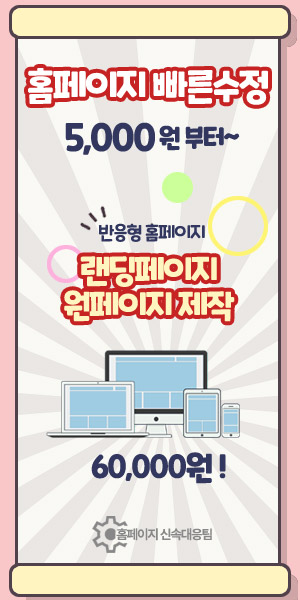"기생사주 가지고 있는데..." 용군TV 용인점집 유명한점집 옥황선녀
Page info
Writer TV용군 Date20-05-25 00:00 Hit71 Comment0Link
-
 https://youtu.be/DV71zJqq2c0
10- Connection
https://youtu.be/DV71zJqq2c0
10- Connection
Body


"기생사주 가지고 있는데..." 용군TV 용인점집 유명한점집 옥황선녀
무료 점사 신청 방법
용군TV 구독을 하시고 종 모양이 나오면 같이 눌러주시고
용군에게 전화말고 ^^
문자로 그냥 신청 한다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6576-4022
#용군TV #용군TV점집 #유명한점집용군TV
기생(妓生)은 관기, 민기, 약방기생(원래는 의녀), 상방기생 등 예기의 총칭이다. 기녀라고도 한다. 일패, 이패, 삼패 기생을 모두 통틀을때는 '덥추'라고도 불렸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courtesan에 대응한다.
왕족,[1] 양반,[2] 중인, 평민, 천민으로 분류되는 조선의 5가지 신분 중에서 기생은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에 해당되었다.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또는 풍류로 흥을 돋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를 뜻하는 말로, 조선시대에는 양인 여자가 성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으나 기생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일패기생은 매춘을 거의 하지 않고 이패기생은 경우에 따라 하였으며, 기생 중에서도 하급인 삼패기생은 매춘을 거의 업으로 삼았다. 멀쩡히 결혼해 남편이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는 인기있는 일패나 이패 기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는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지만 자리가 자리다보니 몸은 파는 경우가 흔했다.# 즉, 급이나 개인의 형편 등에 따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연예인에서 천한 매춘부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였던 것.
일패 기생들은 그 자체를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기도 한데다, 왕족이나 양반, 부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일패나 이패 기생들은 현대로 치면 톱 연예인인만큼 함부로 건드리는 게 부담스러웠으므로, 진짜로 접대만 하고 몸은 팔지 않는 기생이 있었다. 이런 기생은 사실상 양인으로 취급하였으므로, 외국의 외교관을 접대하는 업무를 맡기도 하고, 은퇴 후에는 기방의 행수[3]가 되거나 일반인과 결혼하기도 했다. 즉,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접대부 정도로만 이해하면 오산이라는 얘기다.[4]
기생의 분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일패기생: 오직 임금 면전에만 노래와 춤을 하는 기생이다. 매춘은 절대로 안한다.
이패기생: 관기와 민기로 나뉘며 관기는 문무백관을 상대하며 민기는 일반 양반을 상대하며 노래와 춤을 춘다. 원칙적으로는 매춘을 하지 않지만 희귀하게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삼패기생: 일반 평민을 상대하는 기생으로 노래와 춤, 매춘을 병행한다.
또한 예술에 중점을 두던 기생과 매춘이 업무이던 유녀와는 따로 구분을 하였다. 성종실록에도 유녀의 음란한 짓을 금지한다는 기록이 있다.[5]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0일 을사 네 번째 기사출처
고급 기생들은 각자 집과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도 했다. 일패의 경우 궁궐에도 출입했다. 양반들은 자신의 후원에 따로 부르거나 교외로 나가서 춤과 음악을 즐기거나 학문이나 시, 글, 그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양반들조차 어지간한 명망이 있는게 아니면 일패기생을 쉽게 부를 수 없었다 한다. 주된 고객층은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춤, 노래, 시조, 화예, 학문 등 수많은 예를 겸해야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관리하는 '기생청'이 존재했을 정도이다.
삼국시대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틀이 잡힌 것은 고려와 조선 시대인데, 각종 정치 제도와 사교적인 자리에 예인이 동원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종합 예술인을 양성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재능, 성격, 인격의 고매함까지 육성하는 엄격한 교육을 관장했다.출처
일단 기예가 뛰어난 기생이라면 신분이 천민이라도 지식인으로 인정받는다. 애초에 높으신 분들을 매일같이 만나야 하는데 교양없는 천것들을 쓸리가 없다. 아무리 삼패기생이어도 일단 낮은 수준의 기예나마 보장되어 있었으며, 이들조차 아무나 만날 수 없었다. 가장 낮은 삼패라도 만나려면 돈이 꽤 필요했다.
조선시대의 창녀는 들병이, 화랑유녀, 작부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들병이는 들병에 술을 담아 떠돌며 파는 이들이었는데 매음도 했다. 화랑유녀는 절 주변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였다. 작부는 술집에서 술과 몸을 파는 이들을 가리켰다. 기생이 창녀인 것이 아니라 창녀는 따로 있었다.[6] 사당패도 떠돌아다니며 공연하면서 매춘을 겸했다.
원래는 이처럼 예술인 취급을 받았던 이들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회기강이 무너지자 매춘 유무에 따라 은근짜와 더벅머리로 분화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해 매춘부 취급을 받게 된다.[7] 현재 기생=창녀라는 인식은 이 시기와 현재 사극들의 영향이다.
이에 조선시대에 '선비문학'을 제외한 예능은 전부 천한 것으로 치부했다는 것과 결합하여 오해가 더 심해진 경향도 있다. 이는 기생 외의 예술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례로 그 당시 사군자, 풍경화를 제외한 그림들, 대표적으로 민속화 등은 '환'을 친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지금까지 전승되는 전통예술(춤이나 음악 등)은 상당수가 기생들에 의해 전승된 것이다. 즉, 이들은 전통 예술을 전승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겸했다[8].
고려가요가 전승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참조
기생 중 유명한 기생으로는 황진이, 논개, 춘향,[9] 이매창 추월(이춘풍전), 홍낭이 존재한다. 참고로 어우동은 기생이 아니다. 오히려 왕족과 혼인한 명문 종갓집의 영애였다.
기방에 우르르 몰려살며 매춘하거나 정말 운 좋게 첩으로 들어가는 것은 삼패기생인 더벅머리에 해당하는 모습인데, 커다란 방에 여러 무리의 손님들이 좌정하고, 여기에 한 명의 기생이 들어갔다고 한다. 각자 기생을 끼고 노는 것은 불가능했다. 돈 많고 높으신 분들은 수준 높은 기생을 자기 집 후원에 불렀으니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 더벅머리(삼패기생)들이 상대한 손님은 주로 높아봤자 양반 가문의 한량이나 군관, 무뢰배, 혹은 돈 꽤나 있는 중인 계층이다.
조선시대에는 사신이나 북방 관리에게 기생을 두어 접대하게 하는 것이 암묵의 룰이었다. '반계수록'에는 “오늘날 관아에서 창기를 길러 사객(使客)이 오면 얼굴을 단장하고 옷차림을 화사하게 하여 그를 접대하게 하는데, 술을 따라 권하고 악곡을 연주하여 흥을 돋우니 이름하여 방기(房妓)라 한다.”라며 관아에서 접대를 위한 창기를 양성했음을 시사했다. 병자호란 직후에 청나라에서 과도하게 기생의 시침을 요구했는데, 이에 반발한 기생들은 자살하여 항거했다고 한다.출처 벼슬아치에게 딸린 방기의 생활은 간혹 기생으로서 큰 연회같은 데에 동원된다는 것 빼고는 일반 어염집 아낙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자기가 모시는 군관에게 지급되는 양료로 살림을 하며 지냈다.출처
조선시대의 춘화를 보면 창기로 추측되는 이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창기라고 할 수 없는게, 상술했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창녀로 분류되는 이들이 따로 있었다.
일부 선비는 도저히 수준이 맞는 사람이 없다며 기생과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지적 교류를 나눴다고 한다. 실제로 기생, 특히 상류에 해당하는 일패들은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았다. 지역에 따라 용비어천가나 유교 경전 등을 읊었고, 기생문학이 따로 남아있을 만큼 그녀들이 시를 쓰는 것도 흔했다.[10] 이는 당연한 것이, 이패기생이나 삼패기생 같은 중하급이 아닌 이상 상대하는 손님들은 모두 상당한 학식을 지닌 선비들이며, 이들은 놀 때도 시를 읊고 사군자를 그리거나 학문과 나랏일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흔했다. 그러니 기생도 당연히 이에 맞춰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안동의 기녀는 대학을 암송하고, 관동의 기녀는 관동별곡을 읊고, 함흥에서는 출사표를, 영흥에서는 용비어천가를 읊었다. 북방이나 제주도에서는 말을 타며 기예를 뽐냈다 한다.
조선은 속옷의 옷감이나 장신구, 옷 색까지 제재할만큼 사치 금지법이 엄격했는데, 기생은 이에 대해 몇 안되는 예외대상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이 입는 양식의 옷과 화장은 금새 유행되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치금지법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그대로 퍼지지는 못했으며, 양반가의 경우 그래도 차이를 두겠다며 흰색 분을 사용하는 기생과 달리 복숭아색 분을 사용했다.
흥청망청이란 말은 기생에서 유래하는데 연산군 집권시 '기생양성소'가 궁궐내로 들어가면서 기생은 '운평'이라고 일컬어졌으며, 운평 중에서 예능이 밝고 색기가 뛰어나면 그 운평을 흥청이라고 불렀다. 왕의 마음에 들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천과흥청'이라는 직급이 된다. 그렇지 않은 흥청은 '지과흥청'이라고 일컬어졌다. 이 흥청의 뜻은 '맑음을 일으킨다'라는 뜻으로 '마음의 맑음을 유지한다'라는 명목하에 연산군은 말 그대로 흥청망청(…) 놀았다. 망청은 후렴구로 흥청의 흥(興) 자와 반대되는 의미의 망(亡) 자를 써서 연산군을 비웃는 의미다. 다만 운평을 반드시 기생들 중에서만 뽑은 것만은 아니고, 기생 출신의 첩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얼굴이 예쁘고 춤을 찰 추는 민간인 여자들을 마구잡이로 데려갔다. 나중에는 연산군이 명한 2천명이란 수를 채우기 어려워 얼굴이 추해도 춤과 노래만 되면 죄다 끌고 갔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주류 학계에 속한 학자들은 이런 기록이 신빙성이 있어 보일 만큼, 연산군이 개막장 폭군이었음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후 반정을 일으켜 집권한 중종은 사회 풍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가운데 의녀, 창기의 연회 참여를 금지시킨 일이 있다. 원래 의녀는 부인의 진료를 위해 뽑힌 일종의 의료직이었으나, 연산군 대에 의녀도 연회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기생과 겸업하게 되었다. 1510년 중종은 크고 작고 간에 연회를 할 때 의녀나 창기를 부르는 것을 엄금하도록 사헌부에 명령하고 절목을 만들도록 하여 위반자는 물론, 의녀나 창기도 중벌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는 연산군이 뿌린 악습을 거둬내려고 한 중종의 노력이자, 기생에 대한 민중의 민심을 다잡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의녀의 연회 참여는 이어져서 결국 '약방기생'이 의녀의 별칭이 되기까지 이르렀다.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