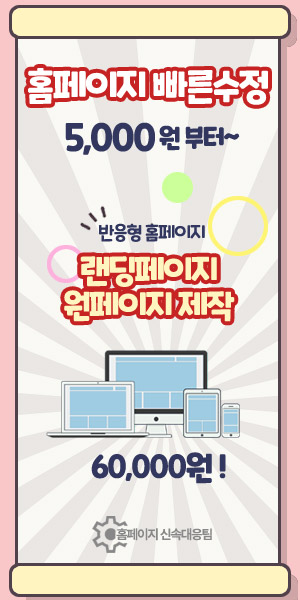작명 이름이 주는 행운과 복 돈이 붙는 상호 - 부천 부산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연화암 이보
Page info
Writer 굿엔트 Date22-04-15 00:00 Hit25 Comment0Link
-
 https://youtu.be/9wH-580TcuI
1- Connection
https://youtu.be/9wH-580TcuI
1- Connection
Body


#작명 #이름이_주는_행운과_복 #돈이_붙는_상호 #용한무당추천 #부산점집 #부천점집 #근처점집 #점집추천 #점집후기 #재수굿 #신내림굿 #연화암 #이보
연화암 이보
[상담전화] 010.8777.9782
[상담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시청역 롯데골드로즈 1720호 연화암
[촬영문의] 010-9768-1638
안녕하세요 “굿엔트”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을 알리는 곳으로 민속신앙 선생님들의 무당 이야기와 국보신앙 세습에 대하여 바르게 소개합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굿엔트]네이버 https://blog.naver.com/goodent1638
[굿엔트]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odent1638/
[굿엔트]트위터 https://twitter.com/Goodent6
[굿엔트]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goodent1638
[굿엔트]스토리채널 https://ch.kakao.com/channels/@goodent1638
이름: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
‘하늘은 녹(祿)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름 없는 풀이 없는데 하물며 이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존재 가치나 의의(意義)를 뜻한다.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사물은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되고, 의미를 얻게 됨으로써 존재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민들레나 개나리가 우리들에게서 구체적인 이름을 얻고 있는데, 길섶에 있는 풀들은 구체적인 이름을 얻지 못하고 그냥 잡초라고 불리고 있다.
그것은 잡초는 잡초로서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민들레나 개나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냥 민들레면 민들레지 그것들 하나하나에 따로 붙여진 이름이 없다. 그냥 돌멩이면 돌멩이고, 바위면 바위지 그 이상의 다른 이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특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 이름을 얻게 된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들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둥이나 바둑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러나 그 개가 울타리 밖을 나서면 그저 누구네 집 개일 뿐 검둥이나 바둑이가 되지 못한다. 남들에게는 그냥 개라는 짐승의 의미만 지닐 뿐 그 이상의 유의미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요구한다. 이름을 알 필요가 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고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유의미한 개체요 존재이기 때문이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豹死留皮人死留名).’고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목적 그 자체이다.
영역닫기이름의 말뜻
‘이름’이라는 낱말을 겉모양으로 보면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르다[謂]’라는 동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동사의 명사형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원을 따지는 데 있어서 현상만을 두고 비교하는 것은 때때로 엉뚱한 결론을 빚을 염려가 있다. 15세기 국어에 있어서 이름의 어형은 ‘일훔’, 혹은 ‘일홈’이요, ‘이르다’는 ‘니르다’로서 형태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15세기에는 ‘일홈’의 기본형에 해당될 ‘*일ᄒᆞ다’ 또는 ‘*잃다’와 같은 어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ᄒᆞ다, *잃다’와 같은 어형이 15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였을 것이고 그 뜻은 ‘부르다[呼, 稱]’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의 ‘일○다[稱]’에서 어간 ‘일○-’은 ‘일ㅎ+*ᄀᆞᆮ-[呼+曰]’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15세기초에 ‘*일ᄒᆞ다, *잃다’라는 동사는 ‘니르다[謂]’에 합류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름’과 ‘이르다’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적 동일성이 앞선 시대의 형태발달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두 어형 사이의 의미적 유연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역닫기이름의 역사
흔히, 이 세상의 모든 단어들은 이름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실에 대한 의미부여에서 비로소 단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존재가 이름을 뜻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으로 이름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이름이 없는 한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하거나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이름은 인간생활은 물론 본질적인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음 항목들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한국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발달해왔는가를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삼국시대 이전 이름
한 개인의 출생이 그러하듯이 인간의 언어생활은 이름을 짓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우리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사서(史書)인 『삼국사기』·『삼국유사』의 이야기가 이름을 풀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혁거세(赫居世)나 알지(閼智), 그리고 수로(首露)의 전설은 한결같이 이름이 붙은 내력을 말해준다.
흔히 이들 이름에는 박혁거세나 김알지처럼 성씨(姓氏)가 함께 주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후대의 관념일 뿐이다. 박에서 났기 때문에 박(朴)을 성으로 삼았다든지, 금궤에서 났기 때문에 김(金)을 성으로 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성씨에 대한 관념이 정착된 후대의 해석일 뿐이다.
흔히 김알지의 자손으로 알려진 말구(末仇)·아도(阿道)·미사흠(未斯欽)·사다함(斯多含) 등을 그냥 이름만 부를 뿐, 김말구·김아도·김미사흠·김사다함 등으로 부른 예가 없는 것을 보면 고대에는 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씨족이름으로 세습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서(漢書)』를 비롯한 중국의 역사서를 보아도 삼국시대 이전의 이른 시기에는 왕이건 벼슬아치건 간에 성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서』 왕망전(王莽傳)에도 주몽(朱蒙)의 이름으로 추(騶)가 나타나 있고, 『후한서(後漢書)』의 고구려전에도 왕들의 이름에 성을 쓰지 않았다.
추·궁(宮)주 01)·수성(遂成)주 02)·백고(伯固)주 03)·대가(大加) 등으로 이름만 나타나 있다. 또한 『삼국사기』의 고구려전에도 이이모(伊夷母)주 04)·위관(位官)주 05) 등과 같이 성이 없다.
그러던 것이 남북조시대의 『송서(宋書)』에 이르러 비로소 장수왕을 고련(高璉)으로 기록하여 고구려 왕실의 성을 적고 있다. 백제도 온조(溫祚)를 비롯한 초기의 왕들에게는 성이 없는데 13대 근초고왕부터 성을 써서 여구(餘句)주 06)·여영(餘瑛)주 07)·여비(餘毗)주 08)·여륭(餘隆)주 09)·여명(餘明)주 10)·여창(餘昌)주 11)으로 적다가 29대 무왕 때부터는 달리 부여씨(夫餘氏)로 적고 있다.
신라의 왕들도 초기에는 모두 이름만 적어오다가 23대 법흥왕을 모명진(募名秦)이라 하여 성을 모씨(募氏)라 하였고, 『북제서(北齊書)』에서 진흥왕을 처음으로 김진흥(金眞興)이라 적음으로써 신라의 왕가 성씨를 밝히고 있다. 왕의 경우가 이런 것을 보면 삼국시대 이전의 평민들에게는 아예 성씨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방증하는 자료로 진흥왕시대(540∼576)에 건립된 순수비(巡狩碑)와 적성비(赤城碑), 그리고 578년(진지왕 3)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술오작비(戊戌塢作碑) 등에 관리들의 이름에 성씨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예컨대, 568년(진흥왕 29)에 건립된 마운령비(摩雲嶺碑)에는 “喙部 居杜夫智 伊干”, “沙喙部 另力智 迊干” 등의 인명이 다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앞에 쓰인 ‘喙部(탁부)’·‘沙喙部(사탁부)’ 등은 마을이름이고, 다음에 쓰인 ‘居杜夫智(거두부지)’·‘另力智(영력지)’ 등이 사람이름인데 성을 쓴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의 ‘伊干(이간)’·‘迊干(잡간)’ 등은 벼슬이름이다.
신라인의 이름에는 ‘智’ 혹은 ‘知’·‘只’ 등이 쓰인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閼智(알지)’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단순한 인칭접미사이거나 존칭접미사인 듯하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유리왕(儒理王) 때에 육부(六府)에 성(姓)을 내려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름을 적을 때 성을 쓰지 않고 마을이름과 사람이름만 쓴 것을 보면 고대인들에게는 성씨의 관념이 없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신라 35대 경덕왕 때에 와서 지명과 인명·관명(官名) 등을 한자식(중국식)으로 바꾼 것을 보면 삼국시대 이전의 이름들은 모두 순 우리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미추왕의 이름은 비록 한자로 쓰여 있으나 한자의 뜻과는 전혀 관계 없이 ‘믿왕(本王, 始王)’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가 곧 김씨의 시조왕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진흥왕 때 세워진 단양적성비(丹陽赤城碑)의 인명을, 1979년 최범훈(崔範勳)이 시독(試讀)한 것을 소개하면 당시인들의 이름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伊史夫智(잇부지) 西夫叱智(셧부지)
內禮夫智(놀부지) 比次夫智(빗부지)
助黑夫智(죠검부지) 豆弥智(둔지)
武力智(무력지) 導設智(도셜지)
也尒智(야이지) 巴珎婁(바도루)
刀只(도기) 烏禮兮(오례혜)
道豆只(도두기) 勿支次(물기지)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