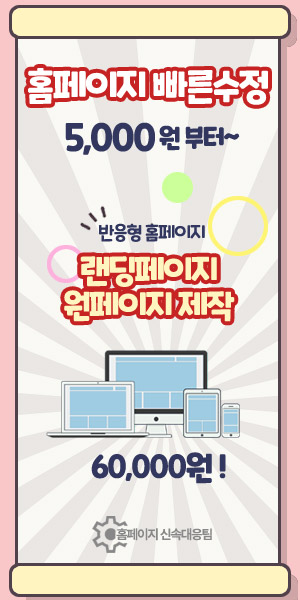뱀띠운세 닭띠운세 소띠운세 삼재풀이 홍수맥이 액막이 필요한 분들에게 알립니다 - 일산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한적화
Page info
Writer 굿엔트 Date20-02-17 00:00 Hit29 Comment0Link
-
 https://youtu.be/GBvQT090haE
3- Connection
https://youtu.be/GBvQT090haE
3- Connection
Body


#뱀띠운세 #닭띠운세 #소띠운세 #삼재풀이 #삼재푸는법 #2020년_신년운세 #일산점집 #근처점집 #점집추천 #점집후기 #용한무당추천 #재수굿 #신내림굿 #한적화
한적화
상담전화:010.8285.1811
상담장소:일산 시장(앞)
[굿엔트]촬영문의 010.9768.1638\r
[굿엔트]유튜브채널 \r
https://www.youtube.com/channel/UCM6gid2jm7Pc7d_wOrDgQQg\r
[굿엔트]네이버 https://blog.naver.com/goodent1638\r
[굿엔트]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odent1638\r
[굿엔트]트위터 https://twitter.com/Goodent6\r
[굿엔트]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goodent1638\r
[굿엔트]스토리채널 https://ch.kakao.com/channels/@goodent1638\r
\r
우리나라 전통의 민간신앙을 알리는 곳으로 무속인의 이야기와 무속 문화 세습에 대하여 바르게 소개합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항상 좋은 날 되세요!\r
\r
민속신앙 전문 유튜브채널 '굿엔트' -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경자년 삼재띠는 어떤 일이 생기며 좋은 운세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삼재라는 것은 9년 주기로 돌아서 3가지의 액난이
3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첫번째 해에는 들삼재, 두번째 해에는 눌삼재, 세번째 해에는 날삼재라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삼재가 들어오는 해인 들삼재에 재난의 강도가 가장 심하고, 해가 바뀔수록 강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첫번째 해인 들삼재에는 항상 조심하고 어느정도 대비를 해두는게 좋아보입니다.
2020년 삼재띠는 이미 시작된 두번째 해인 묵삼재\u0026눌삼재인데, 뱀띠, 닭띠, 소띠가 지금 삼재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삼재띠입니다.
뱀띠 : 53, 65, 77, 89, 01년생
닭띠 : 57, 69, 81, 93, 05년생
소띠 : 49, 61, 73, 85, 97년생
삼재띠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재난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상해를 입는 재난인 “도병재” 금전적인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 “기근재”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역력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사고, 사기, 부도, 파산, 병,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연인과의 뜻하지 않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어이없는 이슈로 사회적 위치가 떨어지며 생각지도 못 한 병을 얻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재물이 쌓이지 않으며 쓸데없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긴다거나 자연 재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눌삼재가 들어설 텐데, 2019년 작년 보다는 삼재난의 강도가 덜하게 되겠지만 매사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큰 일을 벌이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이 지나고 22년부터는 새로운 삼재띠가 들어섭니다. 3년 동안 용띠, 원숭이, 쥐띠가 시작되니 미리 알아두시고 대비하시면 좋겠죠! 지금 삼재띠인데 여러가지 삼재난들을 체감하고 있다면 아마 어떻게 풀어야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리고 삼재가 아니더라도 평소 남들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재물, 금전운이 좋지 않아 돈을 쉽게 모으지 못 하는 분들도 계시죠. 삼재풀이하는 방편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위한 용궁풀이와 충살을 풀어내는 세습도 있으니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셔서 편안한 운세를 누리시길 바라고 방치한다면 나쁜 기운들을 몰아내긴 어렵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액막이:‘도액(度厄)’ 혹은 ‘제액(除厄)’이라고도 한다. 액막이는 대개 정월에 하는데 액이 닥쳐오리라고 생각될 때에 비정기적으로 행하기도 한다.
액막이를 하는 방법은 혼자서 간단히 하는 방법, 또는 무당 등을 불러서 하는 방법 등 다양한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초에 삼재(三災)가 든 사람은 머리가 셋이고 몸뚱이가 하나인 매그림이나 호랑이그림 또는 부적을 방문 위나 문설주에 붙여서 액을 막는다.
또 그해의 신수가 나쁜 사람은 정월 열 나흗날 밤에 짚으로 오쟁이 세 개를 만들어 그 속에 모래나 돌, 그리고 동전 몇 닢을 넣고 개천이나 징검다리 사이에 놓아 디딤 다리가 되게 하는데, 이를 ‘오쟁이 다리놓기’ 또는 ‘노두(路頭)’라고 한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남자의 나이 10세, 여자의 나이 11세가 되면 재액을 가져다주는 별인 ‘제웅직성[羅睺直星]’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별을 쫓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 짚으로 제웅(짚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그 안에 동전과 성명·출생년의 간지(干支)를 적어 넣고 세 갈림길에 버리는 액막이를 한다.
또 그해에 액이 든 사람이 자기 나이 수대로 삶은 팥알을 가지고 밭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팥알을 하나씩 넣어 묻는 액막이를 하는데 이것을 ‘매성이 심기’라고 한다.
남자 13세, 여자 14세, 그리고 그 뒤 9년마다 돌아오는 해직성[日直星]이나 남자 15세, 여자 16세, 그리고 그 뒤 9년마다 돌아오는 달직성[月直星]을 만난 사람은 종이로 해와 달과 자기의 버선본 모양을 오려 대나무에 끼워 지붕의 용마루에 꽂는 액막이법이 있다.
또 남자 12세, 여자 13세 그리고 그 뒤 9년마다 돌아오는 물직성[水直星]을 만난 사람은 종이에 밥을 싸서 우물물 속이나 흐르는 물에 던져 넣어 액을 막는 방법도 있다.
액막이로 하는 연날리기는 ‘액연’ 또는 ‘방연(放鳶)’이라고 하는데, 이 연날리기는 남자아이들이 연에 ‘송액(送厄)’·‘송액영복(送厄迎福)’·‘재액소멸(災厄消滅)’ 등의 글귀나 성명과 생년의 간지를 써서 띄우다가 줄을 끊어 날려버리는 놀이이다.
여자아이들이 정월대보름 저녁 때 나무로 만든 세 개의 호로(葫蘆)에 청·홍·황색을 칠하여 색실로 끈을 만들어서 차고 다니다가 길에 몰래 버리는 액막이법도 있다. 그리고 열두 달의 액운을 막기 위하여 열두 개의 다리를 밟는 ‘답교(踏橋)놀이’도 액막이의 한 방법이다.
또 정월대보름에 달집을 태울 때, 자기 옷의 동정이나 저고리를 불사르면 액막이가 된다고 한다. 오월단오에는 남녀가 창포탕(菖蒲湯)을 만들어 세수를 하며 창포뿌리에 ‘壽(수)’·‘福(복)’자를 새겨 비녀를 만들어서 그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는 액막이도 있다.
유두날에는 밀가루로 구슬모양의 유두면(流頭麵)을 만들어 먹거나 유두면에 오색의 물감을 들여 세 개를 이어 색실로 꿰어차고 다니거나 문설주에 걸어두면 명이 길어지고 액막이도 된다고 한다.
전라남도 무안군에서는 ‘용왕 공드리기’의 액막이를 행하는데, 먼저 정월 열 나흗날 밤 인적이 드문 때, 달걀껍질에 참기름을 붓고 불심지를 만들어 불을 켜서 이것을 바가지 속에 넣고 동네 샘물 위에 띄운다.
물위에 띄워두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거두어들이는데, 이것은 용왕에게 공을 드려 불씨를 올림으로써 액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전라남도 고흥군에서는 그해의 운수가 나쁘다고 할 때 이의 액막이로서 ‘용왕 밥주기’를 하는데, 바가지에 불을 켜놓고 밥과 액막이할 사람의 이름을 쓴 종이를 담아서 먼바다에 띄워보낸다.
이와 비슷하게 정월보름 밤, 그해의 액막이를 위하여 깨끗한 종이에 흰밥을 싸서 강물에 던져 고기가 먹게 하는 액막이도 있는데, 이것을 ‘어부슴’ 혹은 ‘어부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 가정의 1년 동안의 태평을 빌기 위해서 길일(吉日)을 택하여, 무당·경문쟁이·점쟁이 등을 불러 경을 읽어 액막이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액막이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서울 지방의 경우, 정초에 그해의 재액을 물리치기 위한 액막이굿을 행하며, 전라도 지방의 경우, 정초는 물론, 하는 일이 잘 안되거나 가족이 군에 입대할 때에도 한다.
액이 찾아들 때는 개인이나 한 가족이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액막이는 개인이나 가족을 단위로 행하게 되고, 가족적인 행사로 치르게 되며, 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드는 액을 막고자 할 때는 마을단위의 동제(洞祭)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액막이는 재난·질병 등의 재액이 물리적인 실체를 지니고 인간의 생활공간을 내왕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생겨난 행위이며, 재액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풍요와 건강,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