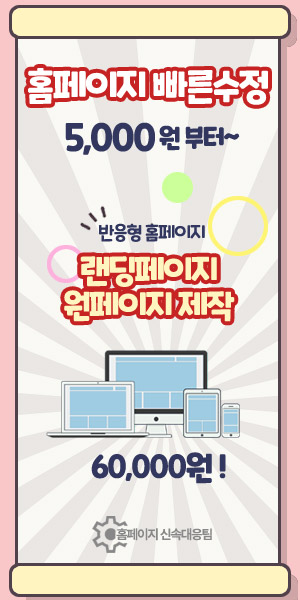[철학유치원] 이마누엘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5분만에 읽기
Page info
Writer 인문학 유치원 Date19-11-13 00:00 Hit25 Comment0Link
-
 https://youtu.be/-1Mdyi9uDUk
2- Connection
https://youtu.be/-1Mdyi9uDUk
2- Connection
Body


서양철학의 위대한 별, 이마누엘 칸트의 3대 비판서 중 두 번째 책이자 윤리학 분야를 다루고 있는 '실천이성비판'을 함께 읽어봅니다!
===
칸트는 인식론뿐만 아니라 윤리학에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칸트 이전의 윤리학에서 중심에 놓이는 것은 언제나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도는 것은 ‘법’, 다시 말해 도덕법칙이었죠. 하지만 칸트는 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법이, 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선과 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선은 간단히 말해 ‘좋음’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거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하죠.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항구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원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영원한 진리나 신적인 것이, 주관적으로는 올바른 이성이나 의지의 사용이 그 예에 속하죠. 이들은 이런 것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원천으로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윤리학이 선의 이념을 통해 추구한 것은 행복한 삶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추구의 궁극적 대상은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도이자 그런 삶을 살아갈 이상적인 인간의 길이었죠. 때문에 칸트 이전의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고대인들에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이상적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이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학에서 도덕법칙은 선이 가리키는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혹은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그 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선의 위성’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칸트는 이러한 선과 법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법을 윤리학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에 두고, 선을 종속적인 위치로 옮긴 것이죠. 이런 구도 속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편적 규칙이 됩니다. 그 규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 절대적인 규칙에 부합하는 행동은 ‘선하다’, ‘좋다’, ‘착하다’라고 말해지는 반면, 그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악하다’, 나쁘다’, ‘죄다’라고 말해집니다. 선과 악은 이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칙과의 일치 여부를 가리키는 술어에 불과해집니다.
그렇다면 칸트는 왜 선과 법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칸트의 시대, 즉 근대는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도시는 출신과 배경,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끊임 없이 이합집산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끼리 이상적인 인간이 무엇인지, 최선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합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적게 하는 것이 평화의 길일 수밖에 없죠. 구성원들이 사이좋게 살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것, 그렇게 정해진 규칙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이 평화롭게 사는 길입니다. 법 중심의 윤리학은 이런 시대적 요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칸트 윤리학의 핵심인 도덕법칙은 내가 살아온 공동체에 의해 주입된 규범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지사용과 결정에서 나온 것에 가깝죠. 이처럼 자유(의지의 자율성)를 법칙의 원천으로, 법칙을 자유의 구체적인 증거로 정의하는 칸트 윤리학에서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 불가능한 일체를 이룹니다.
때문에 칸트는 도덕법칙이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니는 도덕법칙을 정언명법이라 명명했죠. 정언명법은 흔히 다음과 같은 명제로 정의됩니다.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의지하라’는 명제 말이죠. 칸트는 이외에도 ‘다른 사람을 절대 도구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모든 의지의 주체를 자율적 입법자로 대하라’, ‘네가 마치 목적의 왕국의 일원인 것처럼 판단하라’ 등의 격률로 이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적 판단의 원리가 정언명법이라면, 그 명법이 요구하는 행위는 ‘의무’라 일컬어집니다. 의무는 도덕적 판단의 마지막 귀결로서 도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행위는 일차적으로 도덕법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이라는 주관적 조건을 함께 지녀야 하죠. 다시 말해, 그저 행위만 만족하는 경우는 ‘합법적 행위’에 불과하며 이 행위에 대한 존경심, 존중을 함께 지니고 있을 때에야 진정으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칸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 오늘 소개한 실천이성비판의 결론 첫 부분을 장식하는 대목이죠. 칸트는 하늘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작음을, 도덕법칙을 생각하며 인류 전체에 부과된 우주만큼 커다랗고 숭고한 소명의식을 느꼈습니다. 근대 윤리학의 문을 연 인물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말과 함께 세상을 떠난 것이죠.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