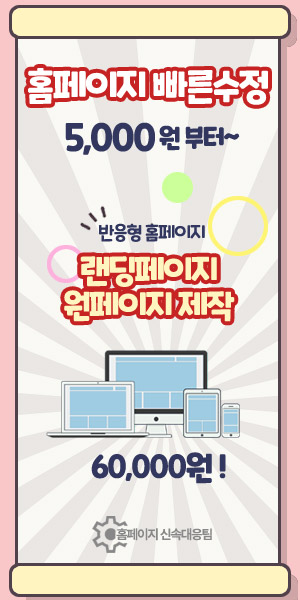성명학 작명학 작명법 과제와 전망 #김만태교수 #사주 #작명 #사주명리 #작명소
Page info
Writer Date25-08-15 00:00 Hit19 Comment0Link
-
 https://youtu.be/YAL_5QEOnpI
3- Connection
https://youtu.be/YAL_5QEOnpI
3- Connection
Body


성명학 작명학 작명법의 과제와 전망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선'사주명리 강좌
https://namestory.kr/bbs/board.php?bo_table=sub3_1\u0026wr_id=212
김만태교수 사주작명원 https://namestory.kr
김만태교수 훈민정음 오행성명 https://blog.naver.com/ware4u
#사주 #사주팔자 #사주명리 #명리학 #김만태 #김만태교수 #추적60분
#운명 #쌍둥이 #작명 #개명 #작명소 #철학관 #유명한작명소 #유명한철학관 #훈민정음 #오행성명 #훈민정음오행성명 #음양 #오행 #음양오행 #천지인 #천지인삼원 #정기신 #천간지지 #천간 #지지
성명학 (작명학 작명법)의 당면 과제와 전망
이번 시간에는 성명학, 작명학, 즉, 작명법에 관한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내용의 원문은 김만태 교수님의 KCI 학술논문,
「한국 성명학(姓名學)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방문화와 사상 제3집, 2017년 2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학적 관점에서 본 논고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단지 언어현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세 기복을 위한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는 성명학에 대해 그동안 관련 학계에서 이루었던 연구성과를 정리한 후, 한국 성명학에 관한 연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연구 경향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고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한자 성명을 수리(數理)작명법이나 역상(易象)성명학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인물의 특성, 작품의 내용 등과 연계하는 경우, 둘째는 실증 사례(개명․이혼․성격 등)를 통해 그 실증성을 통계분석하는 경우, 셋째는 기업 상호명을 수리 성명학 등으로 분석하는 경우, 넷째는 성명학 이론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경우. 다섯째는 현행 한국 성명학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성명학 연구의 역사가 오래지 않고 성명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때문인지 대체로 그 연구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연구주제도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성명학에 대한 연구주제를 다양화하고 연구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학계와 연구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외 향후 과제로는 일본 수리작명법의 적용에 대한 재검토, 현행 발음오행 성명학의 문제점 해결,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실증 사례(개명․이혼․성격 등)를 통해 그 실증성을 통계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순 통계가 아니라 조사집단과 참조집단 간의 비교분석과 조사치의 차이 검증을 통해 심층적인 통계 연구가 이뤄져야 조사 결과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연구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1. 일본 수리작명법 적용의 재검토
성명 한자의 획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배합한 수로 4~5개의 격을 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1~81수의 의미로 이름과 운명의 길흉 관계를 판단해서 이름을 짓는 수리작명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작명법 중의 하나이다.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리작명법의 기원은 일본 성명학의 시조인 구마사키 겐오(熊﨑健翁)가 1920년대 후반에 창안한 오격부상법(五格剖象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에서 [성명의 신비(姓名の神秘)]란 서명으로 발매되면서 큰 주목을 받은 이 작명법은 일본 쇼군들의 흥망성쇠에 그들의 한자성명 글자의 획수를 구마사키가 의도적으로 짜 맞추고, 달[月]과 여성을 상징하는 음(陰)은 흉한 것으로, 태양[日]과 남성을 상징하는 양(陽)은 길한 것으로 하여 81개의 길수(吉數)와 흉수(凶數)로 구분해 만들어진 작명법이다. 그리고 구구원수도(九九圓數圖) 등에 바탕을 둔 채침(蔡沈, 1167~1230)의 81수 관념이나 음양오행론·상수론 등과도 전혀 무관하다.
1930년대에 구마사키 수리작명법을 학습한 일본 작명가들에게는 1940년 때마침 조선에서 강압적으로 시행된 창씨개명 정책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일본식 작명법 전파를 위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연일 신문 광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일본식 작명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때 일본의 작명가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름이 좋은 사람은 번영하고 이름이 흉한 자는 망한다.”는 등의 현혹적인 과대광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 여파로 말미암아 창씨개명 시기 이전에는 그리 일반화되지도 대두되지도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의 일생의 길흉과 깊이 연관되므로 이름을 가려서 잘 지어야 한다는 운명론적 인식이 창씨개명 강행 후에 일본의 작명가들에 의해 생겨났으며, 길한 이름과 흉한 이름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일본식 수리작명법이 성행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좀처럼 무시할 수 없는 철칙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학술적 근거와 역사적 당위성이 결여된 현행 수리작명법은 작명이나 개명 시 적용하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 발음오행 성명학의 문제점 해결
수리작명법과 더불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발음오행 성명학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후음(喉音, ㅇㅎ)과 순음(脣音, ㅁㅂㅍ)을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르게 오행을 배속시켜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글 모음은 전혀 배제한 채 오직 자음만 작명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자음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첫소리(초성)의 오행만 적용할 뿐 같은 자음인 끝소리(종성)의 오행은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소리와 말소리를 표기하는 음소(音素)문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음성학(音聲學)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발음오행 성명학의 경우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의 길이, 음향적 에너지 등을 고려해볼 때 당연히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 제자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 자모음의 오행을 정리하면 예시와 같다.
훈민정음 제자(制字)원리에 함축된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을 준거로 해서 착종된 후음과 순음의 오행 배속을 [훈민정음] 원본인 해례본의 내용대로 수정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함축된 삼재론(三才論)을 준거로 해서 한글 이름자의 중성 모음과 종성 자음의 오행도 작명 시에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에 초성 자음의 오행만을 적용하는 현행 발음오행 성명학에 비해 한글 이름자의 오행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되며 다섯 가지 오행의 천편일률적인 양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3.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의 재검토
한국의 언어 체계는 성음(聲音)을 표기하는 소리글자인 한글과 모양[形象]을 본떠 그린 그림문자인 한자가 공존한다. 그렇다보니 작명법에서도 한글의 발음오행과 한자의 자원(字源)오행 등이 작명의 요건으로 고려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1991. 4. 1)에 의해 출생 신고나 개명 신고를 할 때 한글이 아닌 한자로 작명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한자의 범위 내에서 작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14일, 대법원 규칙 제3030호에 의거, 기초교육한자 1,800자를 포함해서 인명용 한자를 8,319자로 확대 선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선정된 한자 중에는 도저히 인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글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假(거짓 가), 姦(간음할 간), 棺(널 관), 狂(미칠 광), 壙(뫼 구덩이 광), 誆(속일 광), 拐(속일 괴), 馘(귀 벨 괵), 垢(때 구), 難(어려울 난), 盜(도둑 도), 癩(문둥병 라), 死(죽을 사), 蛇(뱀 사), 邪(간사할 사), 殺(죽일 살), 斬(벨 참) 등으로 인명용으로 사용되기에 매우 부적합한 한자들이 인명용 한자로 상당수 선정되어 등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들을 재검토해서 인명용으로 부적합한 한자들은 배제하고, 대신 인명용으로 적합한 한자들을 추가로 더 선정하는 방향으로 학계의 노력이 모아지고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성명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연구 수준의 심화
이름은 좋은 뜻을 담아서 부르기 쉽고 듣기 좋게 짓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에 더하여 작명가들은 음양․오행․사주․수리․역상 등의 요건도 함께 참고해서 길한 이름을 짓고자 한다. 그러나 작명가들마다 작명 방법과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같은 사람, 같은 이름을 두고서도 그 길흉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한자 이름의 획수 계산(음양․수리격․수리오행 요건), 한자 획수 조합에 의거한 격의 구분(수리격 요건), 그에 따른 수리의 길흉 판단(수리격․수리오행 요건), 한자 부수와 자의에 따른 오행의 구분(자원오행 요건), 한글 이름의 자모 획수 계산(음양․수리오행 요건) 등은 작명가들마다 그 기준과 해석이 각기 다르고 부정합(不整合)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수리격 요건은 역학적 근거도 매우 취약하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작명 방법상의 모든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이란 결코 존재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성명학에 대한 불신만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명학에 대한 온전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 성명학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대략 ① 고소설 속의 등장인물의 성명 분석 ② 실증 사례의 통계분석 ③ 기업 상호명 분석 ④ 성명학 이론 전반의 개괄적 고찰 ⑤ 현행 한국 성명학의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경우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명학 연구의 역사가 일천하고 성명학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미흡한 때문인지 대체로 그 연구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석사논문들의 경우는 시중의 작명법 책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글들도 상다수 보인다. 그렇다보니 연구주제도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성명학에 대한 연구주제를 다양화하고 연구수준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학계와 학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