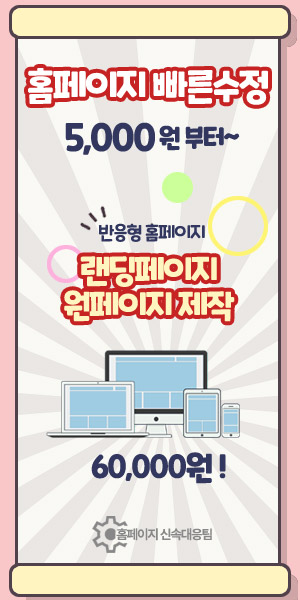토사구팽 사주 - 전광훈 목사 - 오리발을 찬 응원단장 - 8.15 집회 코로나 확산 - 세종시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천…
Page info
Writer 굿엔트 Date20-08-26 00:00 Hit134 Comment0Link
-
 https://youtu.be/Ttv4RSSxxZA
4- Connection
https://youtu.be/Ttv4RSSxxZA
4- Connection
Body


#전광훈_목사 #토사구팽_사주 #오리발_응원단장 #815_집회 #코로나_확산 #점집추천 #점집후기 #용한무당 #용한점집 #세종시점집 #세종시점집추천 #세종시무당추천 #살풀이굿 #재수굿 #점잘보는집 #천향_보살
천향보살
상담문의 : 010.5909.0931
신당위치 :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20단지 2003동
[굿엔트]촬영문의 010.9768.1638
[굿엔트]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M6gid2jm7Pc7d_wOrDgQQg
[굿엔트]네이버 https://blog.naver.com/goodent1638
[굿엔트]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odent1638
[굿엔트]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oodent1638/
[굿엔트]트위터 https://twitter.com/Goodent6
[굿엔트]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goodent1638
[굿엔트]스토리채널 https://ch.kakao.com/channels/@goodent1638
우리나라 전통의 민간신앙을 알리는 곳으로 무속인의 이야기와 무속 문화 세습에 대하여 바르게 소개합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항상 좋은 날 되세요!
민속신앙 전문 유튜브채널 '굿엔트' -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15광복(八一五光復):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사건.
광복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는 의미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는 곧 암흑이라는 인식에 대한 대치관념으로 통해왔다. 따라서, 광복은 나라를 되찾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국가가 있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광복이라는 관념은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강요당한 식민지화 과정이라는 민족적 모순에 대한 반제(反題)로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20세기 초엽, 조선의 마지막 국가였던 대한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1910년 결정적으로 국권을 빼앗기고 그 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하여 우리가 해방되었던 날까지의 시대에 대해서만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반일민족독립운동의 사상과 운동을 포괄하는 관념이다.
이와 같이 광복이라는 말은 논리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온 어휘라기보다는 국권을 회복하였다는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말하자면 민족독립의식이며, 국권회복의식이며, 자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 민족의식은 시대와 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그 내용도 달라진다. 때문에 20세기 초엽부터 광복될 때까지 약 반세기 동안의 광복의식의 변화는 당연히 이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그 변화의 양상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19세기 말에는 무너져가는 국가의 재건을 목적으로 한 애국계몽운동과 독립협회운동 등이 있었고, 그 뒤 의병운동과 같은 반침략호국운동이 있었으며, 1910년의 강제합병 이후에는 대한제국의 부활을 목적으로 한 복벽운동(復辟運動)도 있었다. 이 복벽운동은 왕권국가 회복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때까지는 국권회복이란 왕권국가의 재기·연속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권회복이라는 개념 속에 국체의 근대화문제는 아직 의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한국인의 정치의식 속에서 ‘광복=왕권국가회복’이라는 의식이 종국적으로 청산되었고, 광복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할 나라, 즉 정권형태나 정치·사회제도를 현대 정치사상에 입각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광복운동의 역사는 곧 이러한 현대 정치사상, 다시 말해서 시민적 민족주의사상 및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과 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영역닫기광복운동의 사적 발전과정
1. 내적 발전과정
광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반일독립운동은 엄밀하게 말해서 1910년 8월 22일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 때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만 35년 동안 지속된 민족주의운동이다.
8·15광복이 일본패전의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은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간의 한국민족의 광복운동이라는 주체적 요인이 없었더라면 일본의 패전이 바로 우리의 광복으로 귀결되었을지 의문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것은 다만 우리 민족이 앉아서 연합국측으로부터 광복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우선 반일독립운동의 내적 조건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19년의 3·1운동이 민족독립운동으로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3·1운동은 「독립선언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독립운동의 목적이 현대 국민국가건설에 있다는 것이 천명되었고, 둘째, 이 운동에 참가한 200만명이 외친 ‘독립만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에서 이 운동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은 현대적 국민국가 수립을 의미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사실상 혁명이 아닌 반침략운동을 통해서 전민족이 실천적으로 정치적 근대화를 이룩하였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무력으로 이 운동이 탄압되어 현대적 국민국가를 형성할 공간이 국내에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자 민족운동세력들은 독립정신의 실체적 형태로서의 정부를 해외에 세우려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1919년에 접어들면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3·1운동 직전인 2월에 한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던 노령(露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단체인 전로한족회중앙총회(全露韓族會中央總會)를 대한국민의회로 바꾸면서 정권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그 시초였다.
그러나 상해(上海)에서도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이 있어 이미 파리강화회의에 대표(金奎植)를 파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해오다가, 3·1운동 직후 국내에서의 탄압을 피하여 상해에 모여든 사람들이 독립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1,000여 명이 모여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국무원(國務院)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상해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 정부는 국내외 11개 지방의 각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실질적인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국민대표정권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제의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정권형태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4명으로 구성된 국민대회 13도 대표자의 이름으로 국민대회취지서를 발표하고 1919년 4월 23일 임시정부선포문을 발표하였다. 정부조직은 7부 1국으로 되어 있었고, 13도 대표가 정부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세 곳에서 3·1독립운동을 통한 정권형태의 태동을 보게 되었으며, 그것은 극히 자연발생적인 결과였다고는 하지만 당장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한민족의 통일된 정권형태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기본적 과제였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승만(李承晩)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의 국무총리로, 상해의 국무원에서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로, 서울의 한성정부(漢城政府)에서 집정관총재로 추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워싱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성정부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나 블라디보스토크의 정부들만으로는 통합의 의미가 없고 당장에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상해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두 정부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정부는 모두 스스로를 임시정부로 규정하고 있었던 만큼 언젠가는 통합될 가능성은 있었다.
또 이 임시정부들이 모두 국가구조의 원리를 공화주의에 두고 있었었다는 사실은 그 뒤의 광복운동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 정권형태의 활동은 지역사정으로 인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
우선 서울의 한성정부는 조선총독부의 철저하고도 가혹한 탄압으로 한국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상해의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로서 연통제(聯通制)와 외교활동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연통제는 국내 및 간도지방의 연락조직이며, 이것을 통해서 국내와 간도지방에 대한 조직확대와 자금조달을 하였다. 외교활동으로서도 파리강화회의·태평양회의, 그리고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활동을 벌였고, 독립을 보장받고 국제연맹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일본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제1차세계대전에 참가하여 전승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활동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뒤로는 중국·미국·영국·소련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을 벌여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후원을 얻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외교활동은 정부수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전개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통일연합정부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중국·소련은 제각기 편리한 대로 독립운동세력과 능동적·피동적인 접촉을 계속하였을 뿐이다.
미국은 정부수준에서는 미국에 있었던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를 정식교섭상대로 삼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중국과 소련만이 일본에 대한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독립운동에 대해 정부적 차원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초기부터 손문(孫文)이 상해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인 청년을 중국의 군관학교에 수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차관이나 조차지(租借地) 제공 문제는 미해결된 채로 보류하고, 한국의 광복운동을 돕겠다는 태도만은 분명히 하였다.
이런 관계는 장개석(蔣介石)의 국민당정부시대에 와서도 계속되었고, 윤봉길(尹奉吉)의 의거(1932.4.) 이후에 비로소 광복군양성에 대해서 크게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임시정부와 소련정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소련정부의 전략에 따라서 좌우되었다. 그것은 당시 시베리아에 출병중인 일본군과의 싸움에 있어서 한국독립군을 양성하여 투입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며, 그것도 피압박 민족의 해방이라는 명분 밑에서 이루어졌다.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의 주도로 1920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소련정부 사이에 공수동맹(攻守同盟)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임시정부가 동양에서의 공산주의선전에 협력한다는 전제 밑에서 소련정부는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임시정부에 대하여 40만 루불을 한국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